네이버 검색 결과
목탁소리 법상 비판 내용
2014/04/15 02:09
![]() http://blog.naver.com/ljk2013/140210580721
http://blog.naver.com/ljk2013/140210580721
법상의 목탁소리 - <기도와 수행의 이해>
...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해도, 당장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의식주에 문제가 있거나, 큰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수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로 그런 때에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행보다 먼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수행의 터전을 닦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본질로 들어가는 구조를 띄고 있다.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도와 팔정도, 사념처가 바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중도는 양 극단에 치우침 없고 분별없는 행이다. 양 극단의 판단이나 분별들은 곧 집착을 가져오고, 실체화시킨다. 그렇게 집착하고 애쓴다는 것은 곧 그 대상을 실체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실체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아와 연기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곧 무분별과 무집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팔정도의 핵심 수행법인 정념이고 이를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사념처다.
조금 더 쉽게 단순화하면 중도, 팔정도, 사념처라는 수행은 한 마디로 ‘분별없는 관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분별없이 관찰하라고 하면 잘 집중이 안 된다. 어느 한 가지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모아 집중(止)’함으로써 분별없는 관찰(觀)은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부처님께서는 그 집중적 관찰대상을 사념처 즉 ‘신수심법’이라는 네 가지에 두셨다. 그러나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그 집중하는 대상은 조금씩 달라진다.
우리가 흔히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즉 절, 염불, 간경, 진언 다라니, 위빠사나, 간화선, 묵조선 등 그 모든 수행법들 또한 사실은 ‘분별없는 관찰’의 대상에 따른 수행법이며, 중도와 팔정도, 사념처에 이르는 길이다.
예를 들어 염불수행은 그 집중과 관찰의 대상이 부처님 명호인 것이다. 염불을 하면서 온갖 생각과 판단, 분별들은 내려놓고 분별없이 염불하는 소리를 관찰하거나,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이다. 마찬가지로 절이나 간경, 진언, 다라니, 호흡관, 간화선 등도 근본에서는 마찬가지다. 절을 하면서 온갖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을 쉬고 절하는 몸의 동작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간경이나 진언, 다라니를 외우면서 외우고 있는 것을 분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온갖 번뇌, 망상과 생각을 그치고 마음을 모아 집중하는 수행을 지(止)라고 하고, 분별없는 관찰을 관(觀)이라고 하여, 지관겸수, 혹은 정혜쌍수라는 수행법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불교 수행은 부처님 명호나 진언, 다라니, 호흡, 화두 등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止)하여 분별없이(中道) 관찰(觀)하는 것을 통해 무아와 연기, 중도와 공, 자비를 깨달아 가는 것이다.
현재 한국 불교의 핵심 수행법인 간화선 또한 부처님의 수행법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 원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도 최상승 근기의 수행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볼 간’자로 이 또한 본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워하기에, 화두를 주고 그 화두를 의심함으로써 그 의심 자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화두를 통해 정정과 정념, 즉 지관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분별없는 관찰’이 생겨나는 것이다.
...
수행에 대한 초기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후에 역사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방편의 수행법들을 아울러 닦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 나가되, 어느 특정한 수행법만이 최상이라고 하거나, 특정 수행법을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법은 일체의 상을 타파하는 종교이므로, 수행법의 높고 낮음이라는 상, 수행을 잘 하고 못한다는 상 등 일체의 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http://blog.daum.net/buda1109/13706983
♣
1.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고, 수행의 터전을 닦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결국에는 수행이라는 본질로 들어가는 구조를 띄고 있다.
중도, 팔정도, 사념처라는 수행은 한 마디로 ‘분별없는 관찰’을 의미한다.
→ 석가모니는 가진 명예(지위와 권력)와 돈을 버리고 관수행(위빠사나)을 했는데, 법상은 망상과 뻘짓으로 돈부터 벌고 수행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수행에 들어갔을 때 수행이 잘 안되고, 가진 돈을 유지하고 더 벌기 위해 쌓이는 스트레스만 푸는 마구니의 관수행이 되지 않을까?! 즉, 석가모니 제자란 놈이 마구니를 양산함이고 위빠사나를 마구니들의 무기로 만듬이다.
팔정도에는 정견 정사유도 있다. 정념(관수행)을 통해 정견 정사유로 바르게 분별해서 행한다는 것. 그래야 중도.
"중도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곧 무분별과 무집착으로 이어진다."? 중도는 명상시의 관이 아니다.
2. 즉 절, 염불, 간경, 진언 다라니, 위빠사나, 간화선, 묵조선 등 그 모든 수행법들 또한 사실은 ‘분별없는 관찰’의 대상에 따른 수행법이며, 중도와 팔정도, 사념처에 이르는 길이다.
염불수행은 그 집중과 관찰의 대상이 부처님 명호인 것이다. 염불을 하면서 온갖 생각과 판단, 분별들은 내려놓고 분별없이 염불하는 소리를 관찰하거나,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바로 염불수행이다.
이처럼 불교 수행은 부처님 명호나 진언, 다라니, 호흡, 화두 등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止)하여 분별없이(中道) 관찰(觀)하는 것을 통해 무아와 연기, 중도와 공, 자비를 깨달아 가는 것이다.
간화선에서 간(看)은 ‘볼 간’자로 이 또한 본다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본성을 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려워하기에, 화두를 주고 그 화두를 의심함으로써 그 의심 자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화두를 통해 정정과 정념, 즉 지관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분별없는 관찰’이 생겨나는 것이다.
→ 절, 염불, 간경, 진언 다라니, 간화선, 묵조선(화두참선)은 위빠사나 이후에 생긴 것들이고 '분별없는 관찰(觀)'이 없다. 법상 놈이 위빠사나를 같이 열거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즉, 사마타(止)를 위빠사나(觀)화 시킨 것.
중국 간화선(이뭣고!)은 인도 위빠사나가 굴절되어 '일어나는 이 망상이 뭣고'하며 관(觀)하는 것이었다가, '화두를 이뭣고!'로 변질돼 관이 아닌 사유(思惟)로 변했다. 그래서 화두참선이 생긴 것. 조사선 화두참선은 깊은 사유다. 관수행 없이 사유를 한다. 그래서 팔정도의 정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화두를 주고 그 화두를 의심함으로써 그 의심 자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로 새로운 지관수행을 만들어냈다. 화두참선은 화두에 집중해 깊이 사유하는 것인데 집중 사유 중에 사유(의심)을 보는 게 가능하냐 말이다.
3. "불법은 일체의 상을 타파하는 종교이므로, 수행법의 높고 낮음이라는 상, 수행을 잘 하고 못한다는 상 등 일체의 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위처럼 말장난 잔머리로 사마타(망상을 끊고 대상에 집중하여 소원을 구하거나 답을 찾음)를 위빠사나의 관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 따위 소리를 하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절, 염불, 진언 다라니, 화두들기 등은 이미 상을 두었고 관대상으로 옮기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 집중 중인 사마타니까.
법상은 마구니들의 창조경제처럼 짝퉁들을 진짜처럼 만들어서 정당화시켰다. 기술이 아주 교묘하게 맹랑해 보인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법상은 그 잔머리를 관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블로그 이웃님이 위 글을 읽어보고 견해를 말해달라고 하셔서 몇자 적어 보았다.
그리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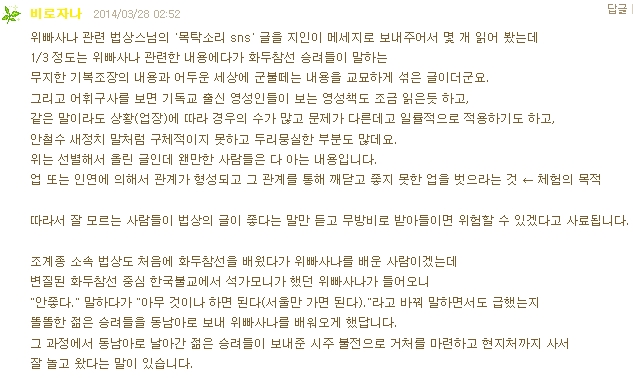
http://blog.naver.com/ljk2013/140209097114
[
'관심통 > 인문·예술·종교·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간화선 (0) | 2014.05.06 |
|---|---|
| 천수경 다라니 논란( 관자재보살, 시바신, 비쉬누신 ) (0) | 2014.04.23 |
| "KAIST에 버젓이 '창조과학관'이 있다니…" (0) | 2010.01.31 |
| 불교의 우주와 윤회 (0) | 2010.01.31 |
| >> 불교관련 사이트 << (0) | 201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