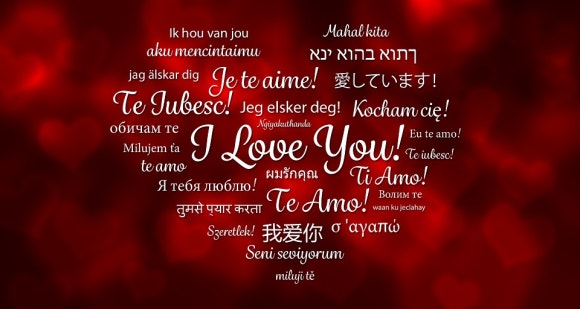원문 https://blog.naver.com/ghangth/221386138134
아래는 원문
밑줄 강조는 내가
세상의 언어를 유형학적으로 나누면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 포합어로 나뉩니다.
포합어(抱合語, Polysynthetic language)는 각각의 낱말이 합쳐진 형태의 언어로 단어가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이누이트 등의 언어에서 발견됩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호크스베이 포랑아하우에 있는 언덕을 원주민 언어로는 '타우마타화카탕이항아코아우아우오타마테아투리푸카카피키마웅아호로누쿠포카이훼누아키타나타후'라고 합니다.
긴 단어라는 포합어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한국어는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입니다.
교착어의 특징은 '토씨'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를 그는 사랑했다."
위의 두 문장은 토씨만 다릅니다.
그리고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착어는 이렇게 토씨가 문장에 문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착어를 배우려면 '토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타이 제어라고 하는 일본어, 터키어, 만주어, 몽골어와 마인어, 바스크어, 헝가리어, 핀란드어, 스와힐리어 등이 교착어입니다.
영어는 굴절어(屈折語, Inflectional language)입니다.
굴절어는 단어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문장에 문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him.' 'He loves me.'의 경우,
주격일 때는 I, He인데 목적격일 때는 me, him으로 변화합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독일어를 배울 때는 이러한 격변화 때문에 외울 것이 많아집니다.
독일어는 4격밖에 없지만 라틴어의 경우는 주격(主格, NŌMinātīvus), 속격(屬格, GENitīvus), 여격(與格, DATīvus), 대격(對格, ACCūsātīvus), 탈격(奪格, ABLātīvus), 호격(呼格, VOCātīvus)의 6격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 외울 것이 많다 보니 정말 힘들게 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일단 외우고 나면 해석할 때는 문법적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는 처음에는 울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공부한다고 하지요.
인도유럽어족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그리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그리고 셈어파 언어인 아랍어 등이 굴절어입니다.
중국어는 언어유형학적으로 고립어(孤立語,Isolating language )입니다.
단어의 변화가 없이 어순으로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냅니다.
"我爱他.", "他爱我."의 경우 어순만 바꾸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앞 문장은 "나는 그를 사랑한다.", 뒤 문장은 "그는 나를 사랑한다."입니다.
고립어는 처음 배울 때는 쉬운듯합니다.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저도 한문 해석을 할 때 "너 주어니? 목적어니?'하면서 단어에게 말을 겁니다.
한문은 해석이 너무나 애매모호합니다.
"死孔明走生仲達"라는 문장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내다."입니다.
하지만 "죽은 공명이 달리면서 중달을 낳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문 고전 공부는 한문과 해석까지 딸딸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러고도 처음 보는 문장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어란 살아있다 보니 계속 변합니다.
영어의 경우 위에서는 굴절어라고 했지만 현대 영어는 격변화가 거의 사라지면서 이미 고립어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buffalo라는 단어가 변화도 없이 지명(고유명사), 들소(일반명사), 위협하다(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심히 괴랄한 문장이 가능합니다.
"Buffalo buffalo buffalo! (버팔로시의 들소가 위협한다.)"
우리말의 경우도 동사의 경우 굴절합니다.
'하다'의 경우 '한다', '했다' '하겠다'처럼 '하'와 '다'의 중간에 접사가 들어가 마치 굴절어처럼 변합니다. (일본어의 경우는 동사에도 뒤에 조사가 붙습니다.)
중국어의 경우는 마치 교착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你吃饭(너는 밥을 먹는다.)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吗를 조사처럼 단어 뒤에 붙입니다 你吃饭吗(너는 밥을 먹느냐?)
(你吃饭吗의 발음은 '니 시벌노마?'입니다.)
저는 혹시 교착어는 굴절어로 굴절어는 고립어로 고립어는 교착어로 변해가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
어쩌면 포합어까지 포함한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누가 벌써 논문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누가 대신 연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작성자 강태형
'관심통 > 교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씨 예쁘게 쓰기 (0) | 2019.10.12 |
|---|---|
| 한문독해첩경 - 올인원버전 (0) | 2019.10.12 |
| 수고하십시오 (0) | 2018.12.24 |
| 한옥구조 사진 (0) | 2018.04.03 |
| 야니 Yanni - 뉴에이지음악 (0) | 2017.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