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4
불교와 과학, 그 멀고도 가까운 거리 / 장회익 - 불교평론
들어가는 말《네 발 위의 부처님(Der Buddha auf vier Pfoten)》(Dirk Grosser 지음)이란 책이 《우리가 알고 싶은 삶의 모든 답은 한 마리 개 안에 있다》는 제호로 번역되어 나온 바 있다. 이 책은 한 젊은
www.budreview.com
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7
진화생물학과 불교 / 전중환 - 불교평론
1. 머리말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과학은 유교가 진실임을 입증합니다. 유교의 경전인 《주역(周易)》에는 만물의 근원이 음과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자생물학자들은 DNA
www.budreview.com
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0
뇌과학과 불교 : 본다(見)는 것을 중심으로 / 신승철 - 불교평론
1. 인간 뇌에 대한 개략적 이해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복잡한 구조가 인간의 뇌라고 한다. 잘 알려졌듯 뇌는 수천억 개의 뉴런(신경세포)들이 유전형에 따라 정확히 배치되어 있다. 뇌 전체는 860
www.budreview.com
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6
양자역학과 불교 :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과 무아의 연기(緣起) / 양형진 - 불교평론
개요양자역학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이론을 포함하여 현대물리학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된다. 양자역학은 뉴턴역학과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는데, 그 대부분은 측정과
www.budreview.com
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69
불교와 화학 / 강종헌 - 불교평론
들어가며불교와 화학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현대 화학을 불교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주의해야 함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화학
www.budreview.com
출처 https://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1
불교와 천문학 / 강승환 - 불교평론
1. 사겁(四劫)《화엄경》의 4겁《화엄경》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이야기한다.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나고 죽음을 반복하듯이 우주도 성주괴공으로 나고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이
www.budreview.com
아래는 각각의 원문, 밑줄 강조는 내가
불교와 과학, 그 멀고도 가까운 거리 / 장회익
- 기자명 장회익
- 입력 2024.09.06 20:50
- 수정 2024.11.10 11:58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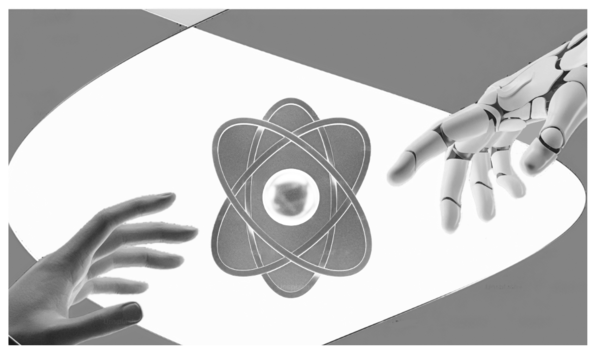
들어가는 말
《네 발 위의 부처님(Der Buddha auf vier Pfoten)》(Dirk Grosser 지음)이란 책이 《우리가 알고 싶은 삶의 모든 답은 한 마리 개 안에 있다》는 제호로 번역되어 나온 바 있다. 이 책은 한 젊은 철학도가 떠돌이 개를 입양해 14년을 함께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감명 깊게 담고 있다. 불교철학을 전공하는 저자의 눈에는 ‘보바’라고 이름을 붙인 이 개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불교의 참뜻을 깨달은 성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네 발 위의 부처님”이라는 다소 불경스러운(?) 제목으로 그들이 함께해 온 생활을 차분히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강아지도 이렇게 불심(佛心)을 보이고 있는데, 사람은 어째서 이 경지에 도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그 해답으로 강아지에게는 제거해야 할 번뇌가 없지만 사람에게는 번뇌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강아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서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람에게는 강아지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더 있다는 것인데, 이를 부정적으로 보자면 ‘제거해야 할 번뇌’가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주체적 삶의 소지’라 할 수 있다. 단지 많은 사람이 이 주체적 삶의 소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날그날의 관성적 삶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소중한 생애를 마감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주체적 삶에 대한 자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이는 한마디로 ‘나는 어떠한 세계에 있는 어떠한 존재이며, 그렇기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제기하고 추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근원적으로 보자면 불교의 가르침이나 자연과학의 탐구 내용도 결국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강조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물음은 ‘나는 어떠한 세계에 있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앞부분과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뒷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연과학이 앞부분의 물음에 강조점을 둔다면 불교는 뒷부분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본래 물음에서 이 두 부분이 ‘그렇기에’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었듯이, 이 두 부분이 각기 독자적으로만 추구된다면 삶에 대한 진정한 주체적 자세라 할 수 없다. 이상적으로는 이 두 부분이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누구에게나 공감이 되고 누구에게도 만족스러운 해답이 주어져야겠지만 현실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에 깔고, 불교와 과학에서 각각 추구하는 깨달음의 방식과 내용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를 불교의 몇몇 중심 사상을 기준으로 살펴 나가기로 한다. 특히 불가에서 말하는 중도(中道)와 무아(無我)의 개념은 삶에 대한 피상적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심층적 이해로 들어가게 하는 방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중도와 무아의 개념이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현대 과학에도 이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中道) 개념
불교 초기 경전에 중(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다.
깟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깟짜야나여, 이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여래는 중(中)에 의해 법을 설한다.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하여 행(行)이, … 생(生)을 조건으로 하여 노사(老死), 우비고뇌(憂悲苦惱)가 생겨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無明)의 남김 없는 소멸로부터 행(行)의 소멸이, … 생(生)의 소멸로부터 노사(老死), 우비고뇌(憂悲苦惱)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리키며, 반면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이 실은 모두 허상이어서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견해를 말하는데, 이 두 견해는 모두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극단에서 벗어날 지혜가 바로 ‘중(中)’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저 가운데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치를 깨우치라는 이야기이다. 위의 사례는 특히 12연기라는 모습으로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이치를 일깨우는 가운데 언급된 것인데, ‘있다’는 것에만 매여서는 ‘소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없다’는 것에만 매여서는 ‘발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무명(無明)’을 통해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하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하면서, 무명에서 벗어남 곧 깨우침에 이르는 것이 최상의 지혜임을 말하는데, 중(中)에 의한다는 것이 곧 깨달은 눈으로 본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또 초기 경전에는 중도(中道)를 언급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비구들이여, 수행자는 이 두 가지 극단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저급하고 천하고 속되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적 삶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으로 가지 않고 여래가 완전히 깨달은 중도(中道)는 눈을 만들고 앎을 만드는 것이며, 적정과 뛰어난 지혜와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여래가 바르게 깨닫고 눈을 만들고 앎을 만드는 것이며, 적정과 뛰어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고귀한 여덟 가지 길[八正道]이니,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다.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초기 경전에서 ‘중(中)에 의한다’는 말과 중도라는 말은 치우침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으로 거의 동의어로 쓰이면서도, 중도의 경우에는 특히 수행의 방식과 그 지침에 관련된 내용 즉 중을 통해 깨달은 자가 가지게 될 지혜의 내용과 바른 삶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 중도의 개념은 초기불교에서 대승 경전과 중관학파를 거쳐 중국의 삼론종(三論宗)에 이르면서 더욱 체계화되고 정교해진다. 여기서는 특히 삼론종의 《대승현론(大乘玄論)》에 나오는 사중이제(四重二諦)와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 개념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대승현론》에는 앎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세상에서 통용되는 앎을 세제(世諦)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한층 심층적인 앎을 진제(眞諦)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여 이제(二諦)라 부르는데, 이러한 이제가 네 개의 층위에 걸쳐 형성된다고 하는 이른바 사중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쪽은 단지, 유(有)를 세제(世諦)로 하고, 공(空)을 진제(眞諦)로 삼는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유(有)와 공(空)을 모두 세제(世諦)로 하고, 비공비유(非空非有)라야 비로소 진제(眞諦)라 부르게 됨을 밝힌다. 셋째 단계에서는, 공(空)과 유(有)를 이(二)라 하고 비공유(非空有)를 불이(不二)라 칭할 때, 이(二)와 불이(不二)는 모두 세제(世諦)이고,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를 진제(眞諦)라 부르게 된다. 넷째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이제(二諦)가 모두 가르침(敎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셋이 불삼(不三: 진제가 아닌 셋)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 더 이상 기댈 것과 얻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참 이치(理)라고 불리게 된다.
또 《대승현론》에는 이러한 이제를 각각 설정해 내는 지혜를 이제각론중도(二諦各論中道)로, 그리고 이러한 이제를 현명하게 결합해내는 지혜를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로 부른다. 이렇게 규정된 이제합명중도는 앞에서 설정된 사중이제 구조와 대략 다음과 같은 연결을 가진다.
우선 사중이제에서는 유(有)와 공(空) 개념을 대응시켜 이제를 말하고 있음에 비해, 이제합명중도에서는 생(生)과 비생(非生)을 대응시켜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중이제에서는 “유(有)를 세제(世諦)로 하고, 공(空)을 진제(眞諦)로 삼는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이제합명중도에서는 이를 이미 중도의 하나로 보면서 비생비불생(非生非不生)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중이제에서 말하는 세제가 유(有)만을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유(假有)로 보아 공(空)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면 이는 이미 중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진제 또한 공만을 내세우지 않고 최소한 가유로서의 유를 인정한다면 이 또한 일정한 중도의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그런 점에서 이들이 각각 이제각론중도(二諦各論中道)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이제는 중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바탕은 여전히 세제와 진제에 두고 있어서 엄정한 의미의 중도에는 아직 달하지 못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제합명중도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제는 ‘진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세제’여서 진정한 세제일 수 없고, 진제 또한 ‘세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제’여서 진정한 진제일 수 없으니, 이 둘을 완전한 하나로 엮는 중도 그것이 바로 이제합명중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앞에 소개된 사중이제 구조는 네 단계에 걸쳐 점점 심화되는 이제합명중도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 네 단계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러한 진행은 굳이 네 단계에 그쳐야 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선종에서는 이를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흔히 사구백비(四句百非)라 하는데, 백 번을 부정해도 역시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중이제론에서는 같은 논리를 무한히 되풀이한다는 것을 피해, 넷째 단계에서 나머지 모두를 아우르는 최종적 진리의 가능성 곧 “더 이상 기댈 것과 얻을 것이 없어야 비로소 참 이치[理]”라는 언설로 대변되는 목표치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대승현론》에 제시된 사중이제 구조를 이제합명중도와 결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식이 형성된다.
1 단계: 유(有)1: 세제(世諦), 공(空)1: 진제(眞諦)
2 단계: 유2(새로운 유와 공1 포함): 세제, 공2(새로운 공): 진제
비공2 비유2(非空2 非有2): 이제합명중도
3 단계: 유3(새로운 유와 공2 포함): 세제, 공3(새로운 공): 진제
비공3 비유3(非空3 非有3): 이제합명중도
4 단계: 이들은 모두 상대적 진리이다. 참 이치는 오직 가능성으로만 남는다.
현대 과학에 나타난 중도 개념
위에서 살펴본 중도의 논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사실을 말한다기보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적용 범위에 어떤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의 패턴이 현대 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중이제의 논리가 물리학 특히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특징짓는 시간과 공간 개념의 발전단계에도 관련됨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거의 누구나 공간이 3차원 구조를 가졌음을 쉽게 동의한다. 그러나 고전 역학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수평 방향의 평면과 수직 방향의 높이를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지평면을 구성하는 수평 방향의 평면 위에도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지형지물과 천체운동 등 우연적인 여건에 기인하는 것일 뿐 원천적으로는 평면상의 모든 방향은 서로 대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위 쪽 방향은 물체를 낙하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평 방향과는 원천적으로 구분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보기 쉽다. 이를 현대의 차원 개념에 맞추어 말한다면 수평 방향의 평면은 2차원 공간을 형성하며, 수직 방향은 이와 독립된 별도의 1차원 공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일상적 경험에서 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공간 개념이다.
사실 이러한 일상적 공간 개념과 좀 더 세련된 3차원 공간 개념은 자연의 ‘실재’를 반영하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진 바탕 관념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느 관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묻게 되는 물음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가 일상적 공간 관념을 취할 경우,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때 만일 우리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왜 안 떨어지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실제로 중세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해 왔다. 반면 우리가 일단 3차원 공간 개념을 수용하게 되면, 물건이 떨어지는 현상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된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은 원천적으로 대등한 것인데, 왜 유독 수직 방향에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다. 이것이 바로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라는 유명한 뉴턴의 물음이다. 그리고 뉴턴이 이 물음에 대해 흡족한 해답을 제시했기에 오늘 우리는 3차원 공간 개념을 어렵지 않게 수용하고 있다.
이제 이 상황을 《대승현론》에 나타난 중도의 개념과 연결해 해석해 보자. 실제로 우리가 지닌 일상적 공간 개념을 세제(世諦)라 하고 좀 더 세련된 3차원 공간 개념을 진제(眞諦)라 할 때, 이것이 사중이제의 제1단계 즉 “유(有)를 세제로 하고, 공(空)을 진제로 삼는다.”는 언명에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유’는 수직 방향의 공간이 “물체를 떨어지게 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다[有]”는 주장에 해당한다면, ‘공’은 “그러한 성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非有], 혹은 그러한 성질의 자리는 비어 있다[空]”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한 성질은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현상[假有]에 해당하므로 이를 세제중도(世諦中道)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성질이 본질적으로는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나타나므로 이를 단순한 비유(非有)가 아니라 숨겨진 비유[假非有]로 보아 이것을 진제중도(眞諦中道)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제와 진제가 모든 면에서 대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2차원+1차원 관점으로 해석하던 현상들을 3차원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은 이해의 폭을 한 차원 넓힌 새로운 깨달음에 해당한다. 세제에 대비해 진제라는 용어를 쓴 것이 이 점을 말해준다.
현대 과학에 나타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한 단계의 이제(二諦)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 단계 곧 “유와 공을 모두 세제로 하고, 비공비유(非空非有)라야 비로소 진제라 부르게 됨”을 밝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론인데, 여기서는 3차원 공간 개념마저도 가유(假有) 곧 겉보기 관념의 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한 단계 뛰어넘는 4차원 시공간의 개념이 좀 더 적절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곧 사중이제의 둘째 단계인데, 이를 유와 공의 관점에서 풀이해 보면, 앞 단계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3차원 공간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有] 있었던 것임에 반해, 새 관점에서는 이것마저도 공간의 한 성분일 뿐 그 독자적 내용이 비었다[空]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 안에는 이 시간의 개념과 함께, 앞 단계에서 진제라 생각했던 3차원 공간 개념이 포함되며, 새로운 공으로서 4차원 시공간이 새 진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공간과 시간이 완전히 대등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간의 한 축을 실수(實數)에 대응시킨다면 시간 축은 허수(虛數) 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만큼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다시 비공비유(非空非有)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두 관점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에 이르게 된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셋째 단계의 사중이제 곧 양자역학을 통한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자역학 이전의 단계에서는 4차원 시공간 이외에 이와는 별개로 4차원 에너지-운동량 공간이 있는[有] 것으로 상정해 왔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독자적인 공간이 아니라 4차원 시공간이 지닌 또 다른 측면 즉 이것의 푸리에(Fourier) 변환 공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 또한 시공 개념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중이제의 셋째 단계에 맞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둘째 단계에서의 공(空)인 4차원 시공간과 4차원 에너지-운동량 공간이 새로운 유(有)로 떠올라 모두 세제를 구성하게 되고, 이들과 구분되는 4차원 겹-공간이 새로운 공이 되어 진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4차원 겹-공간이라는 것은 푸리에 변환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로 엮어졌다는 점에서 기왕의 세제와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이를 다시 이제합명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8)
이제 남아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현대 과학의 공간 개념이 여기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넘어 더 높은 단계의 진제,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이제합명중도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현대 과학에서는 한층 더 높은 단계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공인되고 있지는 않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중이제론에서는 이 넷째 단계에서 또 하나의 상대적으로 진전된 합명중도를 제시하기보다 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수용된 세 단계의 이제(二諦)가 모두 우리가 설정한 상대적 진리 즉 ‘가르침[敎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아직 진정한 진리[理]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유(有)’가 발생하지 않을 완결된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말하고 있다. 현대 과학 또한 이러한 성취를 궁극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으나 어떤 완성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때 현대 과학의 공간 개념 확장에 관한 이러한 도식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중이제의 이제합명중도 구도 도식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이며, 이는 불교적 직관과 현대 과학의 사고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 개념
이번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개념들이 우리의 일상적 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히 무아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 한 예로 붓다가 초기에 무아를 설하여 다섯 비구를 해탈로 이끌었다는 《무아상경(無我相經)》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자.
비구들이여, 색(色)은 무아(無我)이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이 색이 자아라면 이 색은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기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기를’이라고 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고통으로 이끌어지고,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렇게 되기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기를’이라고 해도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수(受)는 무아이다… 상(想)은 무아이다… 행(行)은 무아이다… 식(識)은 무아이다…
여기서는 생멸 변화의 바탕을 이룬다는 오온(五蘊)의 다섯 요소 즉 색, 수, 상, 행, 식 하나하나를 거론하며 이들이 모두 무아임을 말하고 있다. 예컨대 색이 자아라면,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될 것이고, 특히 고통으로 이끌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색이 무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첫째 자아 즉 아(我)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둘째 무아 즉 아가 없으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다. 우리는 아가 없으면 고통받을 리도 없을 것이며 설혹 아가 있더라도 자기의 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을 해명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뜻을 어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를 뜻하는 attā(빨리어)와 ātman(산스끄리뜨어)은 모두 본질, 호흡, 영혼 등의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영원불변, 상주불멸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말은 오온 안에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불변하고 영원한 어떤 것도 들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를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나’라는 집착을 일으켜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오온이 무아(위에 말한 의미)이고 ‘나’가 오온이라면 그 ‘나’가 진정한 의미의 무아 곧 아(我)=무아(無我)라고 하는 이상한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에 우선 경전에서는 ‘나’와 오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왓차곳따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왓차여, 여래, 아라한, 정등각자는 색(色)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 나를 색(色)을 지닌 자로, 나에게 색(色)이, 색(色)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수(受)를 나로 간주하지 않고… 상(想)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 행(行)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 식(識)을 나로 간주하지 않고… 식(識)에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곧 오온과 ‘나’가 무관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전에 언급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오온을 자아로 여기면서 이것이 영구불변하는 어떤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미망을 깨우쳐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온을 자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자아는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오온과 무관하게 오직 주체로서의 자아만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자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난다경》에는 이 점과 관련해 생각해 볼 만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 곁에 앉아 있던 왓차곳따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런데 자아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자아는 없습니까?”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침묵하셨다. 그러자 왓차곳따 유행승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왓차곳따 유행승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왜 왓차곳따 유행승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했다면 이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법들은 무아다[諸法無我]’라는 지혜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여, 왓차곳따 유행승이 ‘자아는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미 미혹에 빠져 있는 왓차곳따 유행승은 ‘오, 참으로 이전에 있던 나의 자아가 지금은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더 크게 미혹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물음의 성격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붓다는 오히려 묻는 이의 정황을 고려하여 ‘그렇다’라고도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그 사람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마음을 쓰는 것이다. 중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가지 답변이 다 불완전한 것인데, 어느 한쪽의 대답을 한다면 듣는 자는 결국 그로 인한 편견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온이 무아라든가, 내가 오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면서도 자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중도의 길을 널리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무아 또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양면성을 이해하기 위해 무아를 ‘실천적 무아’와 ‘형이상학적 무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모든 법은 무아다[諸法無我]’라는 주장은 실천적 무아이며, 이것이 붓다의 주된 관심사이다. 반면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물음은 형이상학적 자아에 관한 물음이며 붓다에게 이는 사실상 부차적인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굳이 이것에 답해야 할 상황이라면 여타의 많은 물음에서나 마찬가지로 중도의 지혜로 대처함이 옳다고 보는 입장이다. 위에 인용된 《아난다 경》의 이야기는 붓다가 이러한 중도의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온생명 관점에서 살펴본 무아(無我)의 의미
위에서 보았듯이 불교 경전에는 아(我)와 무아(無我)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들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 무아 개념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대 과학 특히 온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나[我]’의 개념 또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다면 온생명에서 보는 ‘나’의 개념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 혹은 무아의 개념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지는 않을까?
이 점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지만 특히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과학이 담고 있는 개념들은 사물의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지만, 삶의 지향성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논의가 삶의 주체인 ‘나’와 관련될 때는 곧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문제는 생명의 이해라는 과학적 관심의 주제와 관련이 되면서도 또 삶의 지향이라고 하는 실천적 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서는 먼저 현대 과학 특히 온생명 이론에 나타나는 ‘나’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와 무아 개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라는 관념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이며 또 나에게 있어서 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렇기에 이 논의는 결국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살아 있는 존재와 살아 있지 않은 존재를 구분하고, 살아 있는 존재가 지닌 ‘살아 있음’이란 성격을 추상화하여 이를 생명이라 부른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격을 지닌 존재, 예컨대 다람쥐나 소나무는 생명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 본다. 그런데 문제는 고립된 다람쥐나 소나무가 살아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살아 있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먹이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생명은 이들을 살아 있게 만드는 모든 인과관계의 그물에 엮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생명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인과의 실타래가 어디까지 뻗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과의 실타래가 더 이상 밖으로 뻗어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전 영역을 찾아내었다면, 생명은 바로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지구상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태양과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완결된 인과의 실타래를 이루고 있기에, 우리 생명은 바로 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완결된 인과의 실타래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보아 필자는 이를 ‘온생명’이라 부르고 있다.13) 이렇게 할 때, 다람쥐나 소나무와 같은 각개의 생명체들은 ‘온생명’과 구분해 ‘낱생명’이라 부르며, 이들은 모두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이 함께할 때에 한해 생명의 구실을 하게 된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온생명과 그것의 생리를 밝힘으로써 생명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과학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 즉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물들이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온생명을 형성할 수 있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아무리 심오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그 안에서 ‘주체로서의 나’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이끌어 낼 방도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현재 이를 설명할 가장 적절한 방식은 일원이측면론(一元二側面論)을 택하는 길이다. 즉 이를 기존의 객체적 현상들과 같은 반열에 놓인 또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현상 그 자체의 이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숨겨진’ 속성으로 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모든 객체적 현상의 모습을 이것이 지닌 외적 혹은 표면적 속성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현상의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게 되는 내적 혹은 이면적 속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은 실체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가 가지는 두 양상 곧 ‘객체적 양상’과 ‘주체적 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인간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나’가 굳이 어떤 제한된 범위의 실체 곧 ‘내 몸’과 연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내 의식이 내 몸에 국한된 신경조직망을 통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의 활동을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 ‘내 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경조직망은 외부의 정보도 입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개별 신체를 넘어서기도 한다. 우리는 또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다시 아울러 ‘우리’라는 ‘집합적 주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주체 곧 ‘나’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작은 나’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과의 관계를 인식함에 따라 ‘더 큰 나’로 그리고 ‘더욱더 큰 나’로 내 주체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인간의 집합적 주체 안에 담겨 있던 자아의 내용은 ‘인류’ 곧 생물종으로서의 인간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인간은 인간을 제외한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을 ‘자연’이라 부르며 이를 오히려 인간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아, 자연을 극복 혹은 활용해 인간의 자리를 넓혀 가는 것을 발전이라 여겨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은 인간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들이 합쳐 비로소 생명이 이루어지는 온생명의 한 부분이기에, 우리의 자아 또한 온생명에로까지 확장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생명의 주체적 양상’이라고 할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 만일 주체가 없다면, 현상으로서 생명의 일부는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삶’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이 의식하는 ‘나’ 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어떠한 의미의 삶을 사느냐를 말할 수 있다. 낱생명으로의 ‘내 몸’을 ‘나’로 의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불가피한 것이지만, 여기에만 머문다면 가장 작은 ‘삶’ 곧 소인(小人)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류’로서의 ‘나’까지 의식한다면 이는 전통적 윤리에 부합되는 ‘삶’ 곧 군자(君子)의 삶을 사는 것이 되고, 그 안에 온생명까지 담길 때에 비로소 대인(大人) 또는 성인(聖人)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요소를 주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합을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이제 온생명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나’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나’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불교 경전에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무아’와 ‘자아’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격을 다분히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즉 무아를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자아를 부정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무아 사상이 가진 진정으로 중요한 면모가 바로 주체로서의 ‘나’를 부정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한 중요한 요소를 부정하는 데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무아 사상이 부정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대상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나’, 좀 더 정확히는 개체 생명으로의 ‘나’를 전부로 여기는 그 생각 자체에 해당한다.
이를 온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생명은 오히려 온생명이며 낱생명은 그저 온생명을 바탕으로 하여 잠시 조건부적으로 머무는 것인데, 이를 생명의 전체로 보아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재앙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중도로서 깨우침을 얻어 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진정한 무아 사상의 본질이며, 이 점에서 경전의 가르침은 온생명을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나’로 생각하는 현대 과학의 관점과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온생명 관점에서는 온생명을 위주로 한 여러 단위에서의 ‘나’ 즉 동심원적으로 조화된 ‘나’의 의미를 긍정하고 이 안에서 삶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데에 반해, 불교 경전에서는 이 작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는 데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차이일 뿐 그 본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강조점을 온생명에 두고 이를 진정한 ‘나’라고 할 경우 자연히 낱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서 이것이 초래하는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고, 반대로 강조점을 무아(無我)에 두어 낱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하면 자연히 더 큰 의미의 삶 곧 온생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전에 나오는 붓다의 가르침은 온생명에 대한 어떤 직관적 깨달음에 바탕을 두고 그 실천적 내용을 설파한 것이라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맺는말
이상에서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개념과 무아 개념이 현대 과학의 사상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 과학 안에 이러한 개념들이 반영된 것이 불교 사상의 영향에서가 아니라 과학 자체의 독자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 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중도의 방법 그리고 중도의 지혜라는 것이 종교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도 진리를 깨우쳐 가는 근원적 방식임을 각각 독자적으로 입증해 내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주체적 삶을 위한 근원적 물음의 중요한 실마리가 경전의 오래된 가르침과 현대 과학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 밝혀지리라는 생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우침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몇몇 선각자들이 아무리 외쳐본들 쇠귀에 경 읽기밖에 되지 못한다. 결국은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이러한 깨우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중도와 무아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이제 이 방법론의 신빙성을 불교에서뿐 아니라 과학에서 함께 입증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이는 곧 주체적 삶에 이를 하나의 확실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장회익 zm530@hanmail.net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한성학원 이사장,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과학과 메타과학》 《삶과 온생명》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할까》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화생물학과 불교 / 전중환
- 기자명 전중환
- 입력 2024.09.06 20:56
- 수정 2024.11.11 22:21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1. 머리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과학은 유교가 진실임을 입증합니다. 유교의 경전인 《주역(周易)》에는 만물의 근원이 음과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자생물학자들은 DNA가 두 가닥의 사슬이 꼬여 있는 이중나선임을 밝혀냈거든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응수한다. ‘과학은 기독교가 진실임을 입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혼돈으로부터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우주 전체가 단순하고 보편적인 물리 법칙에 의해 작동함을 밝혀냈거든요!’
불교에 호의적인 독자 여러분은 물론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성립된 기성 종교의 교리 가운데 일부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사실과 우연히 부합한다고 해서 그 종교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대다수 저명한 과학자가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자연법칙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창조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에는 어떠한 논리적 모순도 없다.(몇몇 기독교 신자는 ‘아니, 어떻게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가 보편적인 자연법칙을 통해 드러남을 한사코 외면하는 거지?’ 하고 답답해하겠지만, 다행히 이 글은 그런 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흥미롭게도, 불교의 핵심 사상이 현대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불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서구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지식인은 《불교는 왜 진실인가》(2017)를 쓴 과학저술가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ght), 《나는 착각일 뿐이다》(2015)를 쓴 신경과학자이자 철학자 샘 해리스(Sam Harris), 《불교 이후》(2015)를 쓴 불교학자 스티븐 배철러(Stephen Batchelor) 등이다. ‘불교 예외주의(Buddhist exceptionalism)’를 주장하는 이들에 따르면, 불교는 그 본성이 합리적이고 실증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 불교는 만물을 창조한 신을 무조건 따르는 종교라기보다는, 각자의 마음에 대한 실증적 관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치료법, 생활 방식, 혹은 ‘마음 과학’이다. 해리스는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 의식의 본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탐구자가 상세히 적은 보고서나 실험실 매뉴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불교 예외주의는 속 편하고 경솔한 믿음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리스는 몇몇 동양 전통은 예외적으로 실증적이고 예외적으로 현명하므로,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예외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맞선다.
특히 라이트의 저서 《불교는 왜 진실인가》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불교는 왜 진실인가? 라이트(2017)에 의하면, 불교의 자연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중심 사상이 진화심리학, 신경과학 같은 현대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로 탄탄하게 확증되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윤회와 환생을 강조하는 불교의 초자연적, 신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하는 불교의 자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적 불교의 핵심은 이렇다. 인생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까닭은 우리가 세상을 명료하게 보지 못해서 갈망과 집착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세상을 더 명료하게 봄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 핵심 사상은 인간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라는 진화생물학의 통찰과 겹친다. 개체의 건강, 수명, 혹은 행복을 감소시키더라도,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고와 정서가 자연선택되었다. 왜 마음이 미망(迷妄)과 괴로움에 시달리기 쉽도록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진화심리학의 진단은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그러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일깨우는 불교의 처방과 잘 맞물린다고 라이트는 역설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어느 특정한 기성 종교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이 이룩한 연구 성과와 어쩌다 부합한다고 해서 그 종교의 위엄(?)이 더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불교에 문외한인 필자가 불교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실증적이어서 불교 예외주의가 정당화되는지 엄밀히 검토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이 글의 목표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 진화심리학이라는 경험 과학에 의해 확증된다는 라이트의 주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우선, 마음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게끔 전문화된 다수의 심리적 적응(모듈, module)의 집합으로 보는 진화적 관점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인간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진화한 이유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애초에 진화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본다.
2. 마음의 모듈성 이론
1) 오직 자연선택만이 인간의 마음과 같은 복잡한 적응을 만든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첫 회에는 자폐증 환자인 주인공 우영우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아빠의 얼굴 사진 수십 장을 벽에 붙여 놓고 정서를 학습하는 장면이 나온다. 예컨대, 두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진 표정은 ‘놀람’이다. 윗입술이 올라가고 코를 찡그린 표정은 ‘역겨움’이다. 공부해야 하는 표정은 그 외에도 많다.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했다는 우영우가 왜 저렇게 쉬운 걸 열심히 공부할까? 누군가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 정서를 짐작하는 일은 어린이에게도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에는 정보가 가득 들어 있고, 유기체는 정보를 그냥 다 받아들이면 된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틀렸다! 특정한 유형의 정보를 잘 탐지하도록 ‘설계된’ 기구가 미리 내장되어 있어야만 그 정보는 유기체에 비로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누군가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고 하자. 그가 놀랐다는 정보는 보통의 일반인에게만 입력된다. 바로 옆에 있는 자폐증 환자에게는 입력되지 않는다. 타인의 표정으로부터 정서를 읽어내는 탐지 기구가 결핍된 자폐증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전고투를 겪는 모습을 보면, 표정으로부터 내면의 정서를 추론하는 일을 수행하는 심리 기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얄궂게도, 우리의 마음은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너무나 능숙하게 처리해서 적절한 반응을 척척 내놓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마음의 위대한 ‘설계’를, 그 천문학적인 복잡성을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한다.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내 앞에 순식간에 펼쳐진다. 욕구가 생기면 실행 계획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수립된다. 움직이고 싶으면 팔다리가 내 뜻대로 순식간에 움직인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초록과 빨강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에 극도의 공포를 경험한다면? 그제야 우리는 마음이 천문학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된’ 걸작품임을 실감한다.
인간의 마음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동식물의 특성에서도 복잡한 ‘설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광자를 포획하여 외부 세계의 상을 두뇌에 전달하는 눈, 물의 저항을 줄이고자 유선형으로 미끈하게 생긴 고래, 나뭇잎을 쏙 빼닮아서 포식자를 피하는 잎사귀 벌레 등은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복잡하다. 생명의 복잡한 ‘설계’는 어떻게 생긴 걸까?
1859년에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복잡한 ‘설계’를 만들었음을 입증했다. 태초에 복제자(replicator), 즉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실체가 있었다. 완벽한 복제는 없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복제자들은 서로 조금씩 달라진다.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기는 특성을 지닌 복제자는 그렇지 못한 복제자보다 세대를 거쳐 그 빈도가 높아진다. 이게 전부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각기 다른 복제자 사이의 차등적 번식이다. 어떠한 목표도, 의도도, 계획도 없다. 유전, 변이, 그리고 차등적 번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자연선택이 일어난다. 덕분에 개체군은 당장 처한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지구 행성에서 번성한 복제자는 오늘날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진화를 일으키는 엔진은 자연선택 외에도 더 있지만, 자연선택은 특별하다. 오직 자연선택만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듯한 복잡한 적응을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화를 일으키는 다른 과정은 전적으로 우연에 기댄다. 반면에, 자연선택은 주어진 유전적 변이 가운데 현재 처한 환경에서 복제본을 가장 잘 퍼뜨리는 변이를 일관되게 ‘골라내는’ 유일한 기제다. 자연선택은 무작위적인 변이 사이의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이 누적됨에 따라, 과거의 진화적 환경에서 조상의 번식 성공도에 영향을 끼쳤던 적응적 문제에 대해 자연선택은 꼭 맞는 해결책을 만든다.
고래의 유선형 몸매를 예로 들어 보자. 포유류지만 바다로 영구 이민을 결심한 고래의 먼 조상들은 물의 저항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고래 몸의 형태에 원래 존재했던 유전적 변이 가운데, 물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변이가 후대에 복제본을 더 많이 남겼다. 선택이 여러 세대를 거쳐 누적되었다. 결국 앞부분은 매끈하고 뒷부분은 날카로워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몸매가 고래에게 장착되었다.
요약하자.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잘 남기는,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하는 유전자를 줄기차게, 무덤덤하게 골라내는 맹목적인 과정인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복잡한 적응을 만들었다. 전지전능한 신, 더 높은 질서, 우주적 섭리 같은 초자연적인 설계자는 필요 없다.
2) 마음은 먼 과거의 적응적 문제들의 해결책인 수많은 심리적 적응(모듈)의 집합이다
지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운동을 통제하는 우리의 마음은 눈, 심장, 간, 허파, 팔다리 같은 신체 기관 못지않게 복잡하고 정교하다. 심리적 적응은 어떤 진화적 기능을 잘 수행하게끔 자연선택이 빚어냈을까?
마음의 기능은 정보처리다. 마음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여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조상의 번식에 도움이 된 행동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석기시대의 조상이 길을 걷다가 뱀과 마주쳤다고 하자. 이때 우리의 조상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한 가지였다. 뱀을 보고 군침을 삼킬 수도, 뱀을 짝사랑할 수도, 뱀을 보고 박장대소할 수도, 뱀을 보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 이 중 뱀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편이 번식에 가장 유리했다. 즉, 뱀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뱀을 귀여워했던 이들보다 다음 세대에 후손을 더 많이 남겨서 오늘날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 뱀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적 적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수십, 수백만 년 전에 소규모 사회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했던 우리의 먼 조상이 풀어야 했던 적응적 문제는 위험한 동물 피하기 외에도 많았다. 자식을 무사히 낳기, 식물성 음식의 위치를 기억하기, 동물을 사냥하기, 배우자의 바람을 방지하기, 심장 박동 조절하기, 표정으로부터 감정을 읽기, 우정을 지키기, 언어를 습득하기, 자연재해를 피하기, 길을 잃지 않기, 체온 조절하기 등등 목록은 길게 이어진다. 이처럼 제각각 다른 적응적 문제에 맞추어 전문화된 다수의 심리적 적응이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다. 즉,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든 잘 해결해 내는 요술 방망이 하나만 덜렁 담겨 있지 않다. 각기 다른 용도에 맞추어 특수하게 제작된 연장들이 수백, 수천 개 빼곡히 담겨 있다. 어느 한 문제에만 특화된 해결책은 다른 문제에는 젬병이기 때문이다.
신체 기관을 떠올려 보자. 우리의 몸 안에는 소화, 순환, 내분비, 면역, 근육, 신경, 번식, 호흡, 배설, 골격 등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범용 기관 하나만 들어 있지 않다. 각 기능에 특화된 신체 기관이 빽빽하게 들어 있다. 정신 기관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음식 선호와 배우자 선호라는 두 적응적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영양가가 많고 독소와 병원체가 없는 음식을 고르는 데 필요한 심리 기제(예: 역겨운 냄새가 나는가?)는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이성을 고르는 데 필요한 심리 기제(예: 피부가 깨끗한가?)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진화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각기 다른 입력 정보에 의해 활성화되는 다수의 전문화된 심리 기제의 집합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진화심리학자는 마음의 적응적 설계를 밝히고자 한다. 아래에서 왜 우리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한가에 대한 진화적 설명을 살펴보자.
3. 왜 인생은 괴로움으로 넘치는가
1) 설탕으로 코팅된 도넛의 경우
설탕으로 코팅되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도넛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 절로 군침이 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우리가 도넛에 대해 품는 긍정적인 느낌은, 슬프게도 환영이다. 눈앞에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한다. 의사들은 당류가 넘치는 초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울증, 당뇨병, 암에 걸리기 쉽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먼 과거의 진화적 환경에서는 높은 에너지원이 드물었기 때문에 달고 기름진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심리는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 현대의 산업사회 환경에서 설탕으로 코팅된 도넛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지만, 우리는 설탕으로 코팅된 도넛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환영의 세계에 산다.
도넛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은 돈, 건강, 사회적 지위, 성관계, 고학력, 일류 직장, 해외여행, 명예 등 외부적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면 커다란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기대한다. 다음번의 도넛, 다음번의 성관계, 다음번의 명품 백, 다음번의 명문대 진학, 다음번의 대기업 입사, 다음번의 승진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그러나 라이트(2017)에 따르면 우리가 구하는 쾌락은 빠르게 사라지며 결국엔 더 큰 쾌락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 붓다가 전하는 메시지다.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간절히 바라던 대상을 마침내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불과 2~3주 안에 사라짐을 반복해서 보고했다.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감은 쳇바퀴를 돌듯이 원래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함이 알려져 있다. 말할 필요 없이, 현대의 긍정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경험적 사실은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딴하(tanha), 즉 만족을 모르는 갈애라고 설파한 붓다의 진단과 겹친다.
2) 자연선택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왜 행복은 일시적인가? 왜 우리는 욕망을 채우고도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불만족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이미 살펴보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백만 명의 낯선 대중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산업사회가 아니라, 백 명이 채 안 되는 가족, 이웃, 친구로 이루어진 협소한 수렵-채집 사회에 맞추어서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연선택은 개체의 건강이나 행복을 증진하는 데는 일체 ‘관심’이 없다. 개체가 외부의 실재를 정확히 인식하게 해주는 데에도 ‘관심’이 없다. 자연선택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 조상들이 진화한 먼 과거의 환경에서 번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유전자를 맹목적으로 골라내는 것이다(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는 어떠한 의도도 계획도 없는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과정임을 꼭 유의하길 바란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잠시 자연선택을 의인화했을 따름임을 강조하기 위해 따옴표를 쳤다).
일반인들은 종종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강이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인류의 먼 조상들은 탐욕도, 근심도, 걱정도, 폭력도 없는 고상한 삶을 살았고, 모든 분란과 갈등은 서구 문명이 뿌린 병폐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잠시 자연선택이 마치 행위자인 것처럼 가정하여 사고실험을 해 보자. 유전자를 후대에 많이 남기는 개체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음식을 구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성과 짝짓기하고, 자식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내고, 질병을 피하고, 배우자의 바람을 방지하고, 부족 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기꾼에게 속지 않는 등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개체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먼 과거의 진화적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를 성취하면 쾌락을 느끼게끔 뇌를 ‘설계’해야 한다. 반면 번식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건을 경험하면 불쾌감을 느끼게끔 ‘설계’해야 한다. 애인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외식을 하면,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큰 행복감을 느끼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달성해 얻는 쾌락이 금세 사라지게끔 뇌를 ‘설계’해야 한다. 가령, 어떤 조상이 성관계했더니 그 쾌락이 몇 달 동안 그대로 지속되었다고 하자. 그는 나무 그늘에서 흐뭇하게 쾌락을 만끽하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반면에, 쾌락이 금방 사라진 다른 경쟁자 조상은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짝짓기 기회를 찾아 고단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린 끝에 결국 번식에 성공한 조상들의 직계 후손이다.
셋째, 목표를 달성해도 쾌락은 바로 사라짐을 깨닫지 못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얻을 쾌락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끔 뇌를 ‘설계’해야 한다. 신경과학자들은 달콤한 주스 방울을 원숭이 혀에 떨어뜨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을 조사하였다. 예상대로, 주스가 혀에 떨어지자마자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다음에는 녹색 불이 켜지면 잠시 후에 주스가 혀에 떨어짐을 원숭이에게 반복해서 학습시켰다. 놀랍게도, 불이 켜진 바로 그 순간에 원숭이의 두뇌에서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실제로 주스가 떨어진 순간에는 비교적 적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었다. 주스가 실제로 혀에 떨어졌을 때보다, 주스가 곧 주어질 것이라 잔뜩 기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원숭이들은 더 큰 쾌락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찜해 둔 신상품을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 마침내 ‘구매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의 쾌락이 나중에 그 신상품을 실제로 착용하고 다닐 때의 쾌락보다 더 큰 격이다.
요약하자.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인생이 괴로움으로 넘치는 까닭은 자연선택은 오직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개체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선택에게는 수단일 뿐이다. 목표가 아니다. 자연선택은 개체의 적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 기제라면, 그것이 개체를 행복하게 하건 불행하게 하건 간에 묵묵히 그것을 택할 뿐이다. 예를 들어 성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처럼 끈질긴 욕망이나 질투, 시기심, 분노, 불안, 공포, 혐오, 비탄, 슬픔,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는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할퀴고 쇠약하게 하지만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는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
4. 나를 다스리는 주인인 자아는 존재하는가
1) 의식적인 자아와 불교의 무아(無我) 사상
진정한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다운 선택을 해라.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조언이다. 자기 계발, 여행, 심리치료, 체험 등을 다루는 광고, 강연, 서적, 방송에서는 우리의 두뇌 안에 참된 ‘나’가 있다고 하루가 멀다고 외친다.
사실, 우리는 두뇌 안에 우리의 행동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특별한 누군가가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종종 경험한다. 가끔은 무분별한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항상 일관되게 내리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식적 자아(conscious self)’가 두뇌 안에 있다고 믿는다. 2014년의 나와 2024년의 나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놓여 있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는 까닭은 진짜 ‘나’, 영혼, 혹은 의식적 자아 덕분이다. 일반인이 흔히 품는 이러한 믿음에 따르면, 마치 쇼를 총괄하는 총감독이나 국정을 지휘하는 대통령처럼 의식적인 자아가 내 두뇌 안에서 내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붓다는 나를 다스리는 총사령관, 내 모든 선택의 주체, 혹은 의식적인 자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무아경》에서 붓다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오온, 五蘊), 즉 색(色, 신체), 수(受, 기본적 감정), 상(想, 지각), 행(行, 정서, 사고, 성향, 습관,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선택), 식(識, 의식) 가운데 과연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묻는다. 붓다는 흔히 자아가 지녔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속성인 통제 가능성과 시간적 지속성의 측면에서 오온을 하나씩 검토했다.
먼저 통제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오온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가령, 신체를 크게 다쳤을 때 우리가 고통이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해도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분노나 두려움 같은 불쾌한 감정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 시간적 지속성은 어떨까? 《무아경》에서 붓다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오온 역시 예외가 아님을 비구들에게 설파한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신체, 감정, 지각, 선택, 의식이 나의 참된 자아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신체, 감정, 지각 등의 속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교의 무아 사상에도 불구하고, 뇌 안에 작은 뇌가 들어 있다는, 즉 뇌 안에서 특별한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일관되게 관장하고 통제한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지식 대중을 강하게 사로잡는다. 이채롭게도, 뇌 안에 총사령관 자아가 들어 있다는 시각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실증적 증거가 현대의 자연과학에서 최근 들어 쏟아지고 있다. 바로 살펴보자.
2) 의식적인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
철학자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은 뇌 안의 통제실을 작은 인간(호문쿨루스, homunculus)이 차지하고 앉아서 합리적인 선택을 일관되게 내린다는 믿음은 논리적인 오류라고 비판했다. 그 호문쿨루스는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는가? 호문쿨루스의 뇌에 더 작은 호문쿨루스가 들어 있어서 호문쿨루스를 통제하는가? 그 더 작은 호문쿨루스는 어떻게 호문쿨루스를 통제하는가? 이 무한 연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뇌 안에는 뇌만큼 똑똑한 작은 뇌가 들어 있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뇌는 뇌보다 덜 똑똑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뇌 안에 특별한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은 논리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실증적인 증거가 인지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에서 보고되었다.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선택을 총괄한다고 잠시 가정해 보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선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자.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왜 하필 그것을 선택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왜 우리가 특정한 선택지를 택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선택을 총지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로 1977년 사회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과 티머시 윌슨(Timothy Wilson)이 수행한 실험을 들 수 있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일렬로 놓인 스타킹 네 켤레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중 가장 품질이 우수한 스타킹을 하나 골라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이 스타킹들은 모두 똑같은 제품이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저마다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스타킹을 골랐다. 실험 결과, 맨 오른쪽에 놓인 스타킹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즉, 순전히 대상의 위치가 선택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에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물었더니, 아무도 ‘이게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요.’라고 답하지는 않았다. 참여자들은 ‘이게 감촉이 제일 좋아요’나 ‘이게 빛깔이 가장 선명해요’처럼 스타킹의 원단, 촉감, 색깔 등의 이유를 열심히 주워섬겼다. 요컨대,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한 스타킹을 선택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엉뚱한 이유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사람인 양 남들 눈에 보이려 했다.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선택을 총괄하는 주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이른바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에 관련된 실험이다. 연구진은 실험에 참여한 일반인을 몇몇 사람이 앉아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들과 함께 옆 방에 있는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게 했다. 사실 옆 방에 있는 사람은 연구진의 일원이고, 대화 도중에 갑자기 심하게 발작하는 연기를 한다. 연구진은 참여자가 옆 방으로 바로 달려가서 간질 환자를 직접 돕는지, 아니면 남들이 나서 주길 기대하며 가만히 앉아 있는지 관찰했다. 실험 결과, 방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참여자가 직접 옆 방으로 뛰어가서 환자를 도울 가능성은 뚜렷이 낮아졌다.
놀라운 대목은 이렇다. 연구진이 참여자들에게 방 안에 다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간질 환자를 도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었냐고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다소 불쾌해하며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참여자들은 ‘발작이 그리 심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지켜보려고 했어요.’ ‘옆의 사람들은 무관했어요.’ 등으로 답했다. 요컨대, 간질 환자를 도울지 말지를 실제로 결정한 뇌의 부위는 따로 있고, 우리가 총사령관이라고 믿었던 의식적인 자아는 응급 구조를 남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으로 주변에 비치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가짜 이유를 적당히 꾸며내는 언론 홍보 담당관처럼 보인다.
의식적인 자아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주체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는 인지 신경과학자들이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을 비롯해서 그 밖에도 많다. 만일 의식적인 자아가 쇼를 총괄하는 총감독이 아니라면, 마음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3) 의식적인 자아는 총사령관 모듈이 아니라 언론 당당관 모듈이다
인간의 마음은 먼 과거의 진화적 조상이 겪었던 수많은 적응적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자연선택이 ‘설계’한 다수의 심리 기제(모듈)의 집합임을 상기하자. 마음이 수백, 수천 개의 전문화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는 설명은 종종 각각의 모듈이 우리의 두뇌에서 공간적으로 구획화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 휴대전화에 있는 수많은 앱을 떠올려 보자. 각각의 앱은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달력을 표시하거나 음악을 틀어 달라는 특정한 요구에 의해서만 활성화되어 그에 알맞은 반응을 내놓는다. 그러나 각각의 앱이 휴대전화의 기판에서 경계를 지어 나뉘어 있지는 않다. 보드의 어떤 부위를 송곳으로 쑤시면 다른 앱들은 멀쩡하고 달력 앱만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구성하는 수많은 모듈도 구획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선택을 총괄하는 총사령관 자아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다면, 마음을 구성하는 수많은 모듈 가운데 다른 모듈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심사숙고 끝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총사령관 모듈’도 있지 않겠냐고 제안할지 모른다.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다. 뇌 안에 작은 뇌가 들어 있다는 발상은 논리적으로 오류임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계통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마음은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이 새로운 적응적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차곡차곡 서서히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졌다. 진화의 어느 시점에서 자연선택이 ‘모듈을 총지휘하는 대장 모듈도 있으면 좋겠군!’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번식 성공도를 높여 주지도 않는 대장 모듈을 굳이 만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뇌에는 언제나 수많은 모듈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중 아주 일부의 모듈만 의식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눈 뜨자마자 외부 사물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다. 생물과 무생물, 표정과 감정, 색깔과 질감, 밝기와 어둡기, 정지와 동작을 식별하는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의 수준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얻어진 시각적 이미지를 의식할 따름이다. 모듈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모듈과 상호작용한다. 마음이 수많은 모듈의 집합이고 그중 극히 일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어느 한 모듈을 가리켜 이것이 진짜 나 혹은 진정한 자아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인공지능의 아버지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행위자(agent)들의 공동체이다. 각각의 행위자는 제한된 힘을 가지며 몇몇 특정한 행위자들과만 소통할 수 있다. 행위자 가운데 그 누구도 유의미한 지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힘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리 뇌 안에 쇼를 총괄하는 총감독 ‘나’가 있는 것 같다는 직관을 여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왜 자연선택은 뇌 안에 총사령관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게끔 우리의 뇌를 ‘설계’한 것일까? 진화심리학자 로버트 커즈번(Robert Kurzban)은 저서 《왜 모든 사람은 (나만 빼고) 위선자인가》에서 우리가 ‘총사령관’이라고 믿어온 자아는 실은 총사령관 모듈이 아니라 남들에게 우리 자신을 유능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담당관 모듈이라고 설명했다.
백여 명 남짓한 소규모 수렵-채집 사회에서 평생을 보냈던 우리의 진화적 조상은 자신이 착하고, 유능하고, 믿을 수 있고, 장래가 밝고, 오래 살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해야, 실제로 그러한가와 관계없이 높은 평판을 얻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 있었다. 고기 같은 귀중한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공동 사냥이나 공동 방어에 나서거나, 여생을 함께할 배필을 구하거나, 질병이나 재난이 닥쳐서 도움이 급히 필요한 상황 등에서 사회적 평가나 위신이 낮아서 남들에게 배우자나 동료로 선택받지 못한 조상의 말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의식적인 자아는 총사령관 모듈이 아니라 내 사회적 평판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담당관 모듈이라는 가설은 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진짜 이유를 종종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럴듯하게 꾸며내는지도 잘 설명해 준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끔 결정한 모듈이 그 진짜 이유를 언론 담당관 모듈에게 언제나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주지 않는 편이 평판 관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 담당관 모듈로서는 번지르르한 이유를 사후에 꾸며낼 수밖에 없다. 방관자 효과에 대한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간질 환자를 도와주러 달려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자신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옆에 많이 있음’이었다. 그러나 이를 입 밖에 내면 자기 잇속만 챙기는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이 자신이 도와주러 달려가지 않은 이유라고 진심으로 발언했던 참여자들처럼 말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불교의 자연적, 실증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 진화심리학, 인지 신경과학, 사회심리학 같은 현대 과학으로 잘 뒷받침된다는 라이트(2017)의 주장을 요약 설명했다. 붓다는 인생이 괴로움의 연속인 까닭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설파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감정을 곧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한다면, 나아가 나를 주관하는 주인으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집착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마음이 먼 과거의 진화적 환경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자연선택이 ‘설계’한 심리적 적응의 집합이라는 현대 진화과학의 통찰과 겹친다. 우리가 미망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까닭은 개체의 건강, 수명, 혹은 행복을 감소시키더라도 먼 과거의 수렵-채집 환경에서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고와 정서가 자연선택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다스리는 총사령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총사령관이라 믿었던 모듈은 진화적 환경에서 사회적 평판을 관리하게끔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언론 담당관 모듈이다.
불교의 자연적인 측면이 진화생물학과 심리학의 많은 증거에 의해 지지된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진실일까? 라이트(2017)는 윤회처럼 불교의 초자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책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자연적 불교와 초자연적 불교를 구분하는 라이트의 접근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철학자 이반 톰슨(Evan Thompson)은 어떤 사건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우연(偶然)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불교의 교리는 우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연의 역할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현대 자연과학과 크게 어긋남을 지적한다.33)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자연적 불교의 가르침이 자연과학에 의해 부정된다는 의미에서, 불교는 진실이 아닌 걸까? 보다 근본적으로, 수천 년 전의 농업 사회라는 시대적 한계라는 틀 안에서 여러 사람이 쓴 종교 경전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가 현대의 자연과학이 이룩한 발견과 우연히 부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전중환 evopsy@gmail.com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동생태학 석사를,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심리학과에서 진화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족 내의 갈등과 협동, 성적 혐오, 도덕 심리 등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오래된 연장통》 《본성이 답이다》 《진화한 마음》 옮긴 책으로는 《욕망의 진화》 《적응과 자연선택》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국제캠퍼스) 정교수로 재직 중.
뇌과학과 불교 : 본다(見)는 것을 중심으로 / 신승철
- 기자명 신승철
- 입력 2024.09.06 21:02
- 수정 2024.11.10 12:02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1. 인간 뇌에 대한 개략적 이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복잡한 구조가 인간의 뇌라고 한다. 잘 알려졌듯 뇌는 수천억 개의 뉴런(신경세포)들이 유전형에 따라 정확히 배치되어 있다. 뇌 전체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신경세포는 5천~1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어, 공간적으로는 여러 차원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많은 뇌신경세포의 조합 결과, 작동 여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10의 100만 제곱이다. 우리가 결코 이를 의식하진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의 수를 추정해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잠재성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뇌는 우주의 크기만큼 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뇌과학 일반에서는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면서, 많은 중앙처리장치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슈퍼컴퓨터로 보고 있다. 뇌는 어느 순간에도 수천억 개의 시냅스(신경연접부위)가 활동하고 있다. 신체의 내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정보는 시냅스의 말단으로부터 수 밀리초 내에 거의 동시적으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 연결된 다음, 신경세포에 전기 폭격을 가해 전기적 전달, 곧 하나의 활동전위를 발생시킨다. 뇌는 이런 식으로 즉 시냅스를 통해 전기적-화학적-전기적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간의 영역 간 의사소통을 한다. 시냅스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신경전달물질)은 그 종류가 수십 가지에 이르고, 뇌의 영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 어느 화학물질은 신경계에서 억제 작용을 하고, 어느 것은 흥분 작용을 한다.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이런 원리/메커니즘을 바탕에서 연구되고 개발된 것이다.
마음/정신이란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는 뇌 신경회로에 활동전위가 흐르면서 마음이란 것은 창발적으로 생성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경세포는 서로 연결이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능이 발휘된다. 수많은 신경세포 간 연결이 복잡한 회로를 맺으며 활동하게 되면, 이전에 세포 하나가 갖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두고 창발(創發, emergence)이라 부르는데, 이렇듯 뇌 신경회로의 활성화로 마음이란 것이 창조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다.
2. 뇌과학의 기본 입장
그간 눈부신 뇌과학의 발전은 뇌의 건강, 특히 뇌질환 관련 새로운 병리적 인과의 발견과 치료 방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불교 수행(修行)이 인지기능이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이제 명상이나 수행 관련 뇌과학 영역에서의 논문은 여러 방면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 뇌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크나큰 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뇌과학은 아직 풀어내지 못한 숙제가 많다.
사실 뇌과학은 주로 인지/인식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뇌 연구에서, 불교적 관점의 이해나 검토를 한 것은 인지/인식 영역에 제한된 편일 수밖에 없다. 뇌과학은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성의 문제라든가, ‘내’가 뇌의 어느 곳에 있느냐 등의 문제와 같은, 사변적/주관적 성격의 문제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뇌 신경학적 상관물(neurological correlates)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뇌과학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인간의 심리적 양상이나 행동 특성에 대해, 그것의 뇌 신경학적인 상관성을 밝히려는 게 주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뇌과학과 불교적 이해와의 관련성을 찾는다면, 가령 전오식(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뇌의 어느 회로를 거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밝히는 범위 정도의 일이 된다. 물론 감정이나 장단기 기억 등의 신경회로를 밝힌 것도 뇌과학의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거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의식/마음/정신이란 것의 연구에 대해선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최근에 와서 의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뇌 신경학적 상관물의 근거를 찾아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개가 가설에 불과할 뿐, ‘검증’이 되지 않은 추론에 불과한 실정이다. 뇌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뛰어든 일군의 신경철학자들이 있지만, 이들도 뇌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견해가 분분하다. 신경과학 철학자들 가운데는 마음/정신이란 것의 실재를 믿지 않는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마음/의식의 확실한 뇌 신경학적 상관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뇌과학자 가운데, 특히 행동주의 신봉자들은 그런 의식/마음은 검증이나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것은 있다고 해도 하나의 환상이라는 주장을 한다. 다른 경우라 해도 실험적으로 반복하여 입증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뭐라 결론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의지나 의식 수준 또는 가치 같은 문제는 뇌과학 영역에서는 논외의 주제다.
3. 본다는 것에 대한 뇌과학적 소견
뇌과학 연구 성과의 일부를 간단히 소개한다 해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간략히 언급한다 해도 그 주제의 범위나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여기선 뇌과학의 대표적 연구라 볼 수 있는 본다는 것[見]을 중심으로 뇌과학적 지견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려 한다. 그런 연후에 본다는 것의 전통 불교적 입장(불교인식론)과 그 맥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간단한 비교 검토를 했다. 그리고 본다는 것[見]의 함의를 넓혀, 다시 말해 대승불교/선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觀]의 의미를 함께 검토해 봤다.
본다는 것을 중심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런 배경도 있다. 과거 불교인식론에서는 다섯 감관 가운데 시각을 흔한 예로 삼아 논증을 편 전통이 있다. 그리고 예부터 시각 관련 인식 논증을 통해 나머지 다섯 감관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사실 본다는 것, 본다는 마음은 불교 이해의 핵심이다. 불교 전통에서 본다는 말에는 단지 눈으로 본다는 것[見],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解]. 헤아린다는 것[思]을 포함하는 함의도 있었고, 심지어 느낌[受]이나 인식[識]도 본다는 의미에서 풀이가 되기도 했다. 그뿐인가.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본다는 것[觀]을 제일로 중요한 지혜로 여겼다. 뇌과학에서도 시각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활발했다. 시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감각이라는 이유도 있어, 뇌 연구의 중요 핵심 과제였다.
먼저 본다는 것에 대한 최근 뇌과학 연구의 결과를―일반에서 이해를 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보이나―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본다는 것[眼識]은 사물에서 발산되는 빛 에너지를 눈[眼根]이 활동전위라는 전기로 변환하면서 시작된다. 사물에 대한 시각정보처리는 맨 먼저 망막에 상이 잡힘으로써 시작된다. 망막의 세포에서는 빛이 광색소 분자를 때리면 광 에너지가 흡수되고, 분자는 전기전류를 변화시킨다. 망막에서 변화된 활동전위는 시각로(optic tract)를 따라 외슬핵(lateral geniculate nucleus)으로 보내진다. 외슬핵이란 망막과 피질의 중간에 있는 핵이다. 이는 망막 정보를 받아들여 이 정보를 뇌 후두부에 있는 일차시각피질(약자로, V1)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외슬핵에 있는 신경섬유는 상구(superior colliculus)를 향한 커다란 투사를 하고, 여기서 수많은 비주류 신경절세포들은 시각적 정보를 여러 작은 핵들의 잡다한 집합에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곧 눈 깜빡임, 응시, 동공 조절, 일상의 리듬 등을 조절하는 기능들을 매개한다.
다시 말해 눈에서는 50가지가 넘는 망막의 세포들이 시각정보를 받아들인다. 이 세포의 축삭들은 여러 개의 나란한 통로를 따라, 일련의 일시적인 전기 펄스들로 부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허술한 비유를 들자면, 이들은 흑/백, 적/녹, 청/황 대립 정보를 전송하는 사진기 한 대씩, 시간에 따라 명암이 변화되고 위치를 강조하는 통로 등, 십여 대의 사진기로 구성된 한 세트라 할 수 있다. 이 모두는 외슬핵으로 보내지면서 의식적 시각 경험의 토대를 이룬다. 여기서 한 묶음의 소수 신경절세포는 뇌간의 외진 곳으로 투사 되어 주시, 동공의 직경 등 기본적 기능들을 조절하게 한다.
시각정보처리 과정에서, 외슬핵의 신경세포들은 그들의 신호를 일차시각피질(V1)로 보내는데, 이곳은 피질 시각영역의 첫 번째 장소로, 다시 말해 시신경의 신호들은 외슬핵, 시상 등을 거쳐 V1에서 안정되고 균질하고 그럴듯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다.―말할 것도 없이 만일 시각피질이 없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시각적 인식은 불가능해진다. 만일 눈이 없거나 눈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컴퓨터 칩을 통해 시각피질에 시각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보는 일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안식(眼識)의 중요 관문은 일차시각피질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좌측 외슬핵은 좌반구의 V1에 투사하고, 우측 외슬핵은 우반구 V1에 투사한다. 시야의 중심과 부분은 후두엽(뇌의 뒤쪽 피질)의 맨 뒤쪽으로 표상되고, 시야의 주변 부분들은 후두엽의 맨 뒤보다 좀 더 앞쪽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좌측 V1은 전체 우측 시야에 대한 망막형 지도를 가지며, 우측 V1은 전체 좌측 시야의 지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시각피질에 시각정보들이 온전히 투사가 되어야, 비로소 시각 지도가 만들어진다. 망막에서 시작된 세포의 발생전위를 통해,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시각피질에 시각 지도가 만들어져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V1 신경세포들은 사물의 윤곽과 모습을 구성하는 시각 특징의 방향에 대한 신경 표상을 담당하지만, 이곳 신경세포들은 다른 여러 고위 시각영역들 쪽으로도 신호를 보내는데, 예컨대 색채지각에 특히 중요한 피질 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정보를) 다시 물체 재인(recognition)과 관련된 복측(腹側) 시각경로라 부르는 고위 시각영역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아울러 중측두(中側頭) 영역이라 불리는 영역으로도 보내지는데, 이 영역은 움직임 지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쪽 일부 신경세포들은 다른 많은 움직임 방향을 통합하여, 물체의 전체적인 움직임 방향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 V1에서 더 높은 영역으로 가는 투사 경로에서, 복측 시각경로란 V1에서 측두엽으로 가는 경로로서 물체가 ‘무엇’이냐를 표상하는데, 배측(背側) 경로란 V1에서 두정엽으로 가는 것으로, 물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V1에서 온 신호는 배측(동쪽) 경로를 거쳐, 중측두 영역이나 배측 외선조 영역으로 가고, 그곳에서 다시 두정엽의 많은 영역으로 전파된다. 배측 경로는 시각계가 사물들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사물의 위치를 표상하는 데 중요하다. 중측두 영역이나 배측 외선조 영역은 시각적 움직임과 입체 길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반면, 두정엽의 특정한 영역들은 안구의 움직임이나 시각 공간에서의 특정한 위치로서 손의 움직임을 안내하는 데 특수화되어 있다. 후두엽의 외측 표면에 놓여 있고 중측두 영역 바로 뒤쪽에 외축후두 복합체(lateral occipital complex)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영역은 물체 재인에 강력하게 관여돼 있다. 이 근처엔 방추얼굴 영역이라 불리는 영역도 있는데, 이곳은 사물의 다른 범주에 대한 반응보다는 얼굴에 대한 반응에 훨씬 강하다. 이 영역은 얼굴의 의식적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해마 위치 영역은 또 다른 강력한 범주의 선택적 영역으로서 집, 지형물, 집 안 풍경, 집 밖 풍경에 반응을 제일 잘한다.
요약하면, 뇌의 일차시각피질(V1)은 의식적으로 사물을 시각적으로 지각하는 우리의 능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피질 시각영역들은 의식적 시각 경험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곧 방향성, 움직임, 얼굴, 사물들의 특정 시각적 자극들을 처리하는 데 관여하는 많은 뇌 영역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많은 신경세포들도, 의식적 자각 활동에서 역시 똑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적 인식/의식에서는 혼자 감당하는 단일한 영역이 따로 있지 않다. 대신 많은 뇌 영역이 같이 일하며 의식적 자각/인식을 해내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이다. 또 주의집중에 관여하는 뇌 영역들도, 시각이나 다른 감각 입력에 반응하고 지각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본다는 것은 뇌의 일차시각피질에 시각 지형이 생긴다는 것으로, 그것으로써만 시각적 자각/인식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차시각피질에서 시작된 감각의 분석은 고차원으로 올라가면서, 즉 정보의 분석이 깊어지면서 다른 감각 정보와 연결되고 혼합된다. 이런 뇌의 영역을 연합영역이라 부른다. 다시 말해, 망막에서 시작된 시각정보는 중간에 감각, 운동, 감정 등 여러 가지를 중계하는 시상이라는 곳도 거쳐 가는데, 감각을 맡는 시상 세포에서는 두 갈래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하나는 편도체로, 다른 하나는 대뇌의 감각 피질로 전달이 된다. 편도체는 느낌[受] 곧 감각질(qualia)을 생성하는 물질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곳이다. 요컨대 편도체를 통해 우리는 보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라는 정신적 인식이 가능케 된다. 또 시각정보는 편도체에서 시상하부 및 뇌줄기로 퍼져 가 몸의 반응을 일으킨다. 편도체에서 감지된 느낌도, 몸의 반응을 바탕으로 한 감정도, 그 정보는 이어 전대상 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전전두엽으로 전달이 되어야, 소위 의식/인식이 가능케 된다. 다른 말로 이런 일련의 신경회로의 연합과 동시에 뇌 활성화로, 이 영역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대상을 알아보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의식/인식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차시각피질에 생성된 뇌 활성은 측두엽의 아래쪽을 따라 앞쪽으로 나아가 종국에는 해마에서 그 대상에 대한 모양새가 완전히 분석된다. 즉 표상(representation, percept)이 생성된다. 전전두엽에 (정보 전달이 되어) 포섭된 이 표상에 대해, 전전두엽은 ‘기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과 대조를 하여, 이 표상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판단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想]. 우리가 보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은 대상을 안다는 말이고, 이 아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험에 의한 기억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볼 때, 그 즉시 어떤 느낌과 함께 자신의 과거 경험(기억과 감정)을 투사함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며 판단이라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신경회로에서, 우리는 거의 동시에 다음에 어떻게 무슨 행동[身口意]을 할까를 진행[行]시키기도 한다. 시각정보는 앞서 말했듯 대뇌의 운동피질로도 정보가 전달되어, 수많은 운동신경 세포가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적 순서를 지키면서 그 작동을 격발시킨다.
뇌신경회로의 이 같은 측면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는 대상에 상응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 즉 기억을 불러들인다는 일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따라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보고 있는 대상에 무의식적/비의식적으로 개인의 과거 감정에 뒤얽힌 ‘기억을 투사하여 보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뇌신경회로의 작동이기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사물을 보고는 바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어떻다고 판단하는 일이 평범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 패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식이란 인식 대상에 대한 앎을 말한다. 인식이란 대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상에 대한 최초의 인식은 흔히 지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지란 인식보다 넓은 뜻으로 안다는 의미로 통용이 된다. 뇌과학에서는 보다 깊은 의미의 앎이나 통합적 앎, 곧 지혜라는 것은 전전두엽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생각/사유라는 것은 인식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떠올라야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사유/인식의 무더기를 불교에서는 식온(識薀)이라 부른다. 통상 우리는 이 식온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사실 육식(六識)에서 식은 대상을 감각한 의식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고, 오온 가운데 식온(識薀)은 수온, 상온, 행온을 거쳐서 일어나는 심(心)의식이기에, 우리는 통상 이 식온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4. 전통적 불교인식론과 뇌과학적 소견을 비교해 볼 때
먼저 유부와 관련된 견해다. 유부는 수, 상, 행, 식이 함께 자성(自性)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본래 갖춰진 성품/성질이 있다는 말이다. 자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이 실재한다는 것. 그러나 이런 관점은 뇌과학의 입장과 비교할 때, 그 이해에서 차이가 있다.
불교인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과로서 연기가 되는 조건이나 여건들에 대해선 그것들이 ‘실재’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야 형식상의 언술이 가능해진다. 뇌과학에서도 마찬가지 이치로, 흔히 원자나 분자, 신경세포, 신경회로 등을 흔히 언급하는데, 이때 이런 요소요소들은 실재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다. 뇌과학의 기본 입장은 유물론이기에 요소요소를 마땅히 실재하는 것으로 여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제반 감정/인지/행동은 그러한 신경세포나 신경회로들의 작용 내지 표현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바이고, 여기서 그 신경학적 상관물은 그 인과에서 중요한 매개체인 것이며, 그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부에서는 수, 상, 행, 식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할 때, 뇌과학과는 그런 관점에서 방향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유부와 달리 뇌과학에서는 (주관적으로 보이는) 상, 행, 식을 실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연기적 그물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다시 말해 경(境)과 근(根)과 식(識)이 하나가 됨에 일어나는 것으로, 요컨대 수, 상, 행, 식은 뇌 안에서의 연기의 산물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예시했듯 안식도 그런 양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뇌과학에서는 수, 상, 행, 식에 각자 따로 자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요소의 실재를 인정하는 뇌과학이나 불교인식론의 입장에 대해, 대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약/정리될 수 있을 법하다.
길장(吉藏)은 《성실론》 202품을 살펴보면서, 불교인식론(소승불교)의 특징에 대해 “(그들은) 단지 실(實)로서 가(假)를 분석하여, 공(空)만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실(實)을 간과할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색(色)이 소멸하여 공(空)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니 (그들 논증/해석에 따르면) 색의 자성이 그대로 공인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거기(소승불교)에는 불이(不二)가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실(實)이란 요소들을 실재하는 것으로 봄이요, 가(假)라 함은 주/객 등을 말함이고, 그런 논증을 하는 가운데 공(空)의 작용을 말함, 다시 말해 요소들이 실재한다는 가정의 실로서 가, 즉 주/객이 실체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니, 그게 바로 색이 소멸하여 공이 된다는 논증을 편 꼴이 되는 셈이다. 즉 색이 곧 공이라는 불이(不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돌아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유부의 인식은 마음, 마음 작용이 동시상응(同時相應)한다는 주장을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은 감각여건인 색경(色境), 안근과 인식의 결과인 안식이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 즉 동시적 인과관계에서 생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량부의 주장은 다르다. 마음과 마음 작용은 차례로 계기할 뿐, 서로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모든 마음 작용은 차례로 생기하는 것이지 동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인과는 동시적인 영역 속에 있는 두 사건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시적(異時的)인, 즉 시간을 달리하는 두 사건에 대한 관계다. 그리고 경량부에서는 본다는 것에는 안근과 색경 등의 객체적 여건 그리고 빛과 같은 간접적 조건 등이 모여서 본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런 직접적 경험에는 보는 주체도 없거니와 보이는 대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법의 인과뿐이다. 여기서 ‘본다’는 사실은 결과[眼識], 여건으로서의 안근과 색경은 원인, 그리고 이 둘은 시간을 달리(異時的으로)하여 인과를 맺는다는 것, 그리하여 주체나 대상은 단지 ‘본다’라는 사실의 두 측면의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경량부에선 이처럼 이시적 인과관계를 근, 경-안식 관계에서는 물론 촉-수의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뇌에서 시각정보처리는 각 단계마다 전기적 신호가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식하기 불가능한 정도인 수 밀리초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흐는 빛으로 유발된 활동의 물결파는 망막을 떠나 35밀리초 안에 V1의 거대세포 입력 층에 도달한다고 했다. 각 상으로부터 한 비트의 정보를 추출해야 하는 하측 피질과 그 너머의 주변에 있는 그물망을 자극하기 까지는 100밀리초가 약간 더 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이럴진대 뇌과학은 색경과 보는 과정과 안식의 결과인 ‘봄’에는, 이시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안식이 성립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유부의 동시상응설에 대한 주장이 틀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최근 뇌과학에선 시각정보는 그런 이시적 인과관계의 맥락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뇌의 전두부는 비상하게 확장된 의식의 광활한 작업 공간이다. 이곳은 의식하는 대상을 둘러싼, 정신적 감각을 보완하는 신경계이다. 이는 뇌의 넓은 영역들 사이를 가로질러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초당 30~80번 맥동하는, 안정되고 멀리 뻗어가는 감마파로 동기화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 지금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뇌는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함께 초당 30~80번 맥동하며 동조화(진동 개념임)/동시상응이 일어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동조화 현상은 깊은 수행이나 명상을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임을 과학적으로 밝힌 바도 있다.
유부나 경량부의 이런 관점의 차이에 대해 우리 현대인들은 사변적으로 다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뇌의 동조화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인과의 동시성이요, 봄의 과정을 신경회로 측면에서 구성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이시적인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누가 보는가 vs 무엇이 보는가의 문제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인식론에선 보는 주체도, 객관의 대상도 ‘봄’에 관여되는 연기적 조건일 뿐인 것이며, 결과는 ‘봄’을 의식하는 앎만 있을 뿐, 주체와 대상을 별도의 실재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뇌과학 역시 보고 있는 ‘내’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나’라고 하는 것의 뇌 신경학적 상관물을 입증할 수 없어서다. 다만 가아(假我)로서의 신경망, 즉 이야기하는 가상으로서의 주체, 이야기로 꾸며진 ‘나’가 이러저러한 신경회로에 잠복해 있을 거라는 추정은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시각정보처리 과정의 신경회로에서, 우리는 보는 대상에 상응하여 자신의 과거 경험, 즉 기억을 불러들인다는 일이 동시에 (신경회로에서) 격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봄에 있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봄’에 내가 본다는 수, 상, 행, 식이 (자연스럽게) 동시에 끼어드는 신경망 활성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렇듯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무의식적/비의식적으로 개인의 과거 감정에 뒤얽힌 기억을 투사하여 보게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객(主客)의 분리/의식이 자연스레 생기게 되어 있다.
또 하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개체는 생명 유지와 종족보존이라는 욕망이 최우선이기에, 생존을 위해 오랜 세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의 위협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뇌의 구조나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층위에서의 진화를 거듭해 왔을 터이고, 인간 역시 그런 두려움이 개체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더욱이 인간에게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은 특히 언어를 통해 발달되고 더욱 공고화됐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관습에 젖어 우리는 흔히 무엇을 볼 때, ‘내가 그것을 본다’는 앎에 자연스레 체질화가 된 것이리라.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에서도 이런 자아의식/개체의식을 부정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상의 우리의 자아의식을 참나[眞我]가 아닌 가아(假我)로서 수긍하고 있다. 천태지의 대사는 이를 ‘가립(假立)의 나’라고 수긍했다.
시각인식에 관한 뇌과학의 소견은 본다는 과정에 대한 신경회로/신경학적 상관물에 대한 발견이었다. 그러나 ‘시각에 대한 의식’이 정작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은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의식이 없다면 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일련의 시각신경회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되는 것이고, 의식/마음이 깔려 있기에 시각정보에 대한 자각/인식도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시각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본다는 것이 가능하고 본다는 말도 성립된다. 보고 있다는 것은 이 의식/마음의 바탕으로, 이 마음을 씀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직관적/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뇌과학은 이런 직관적 앎/의식을 과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므로 뇌과학은 ‘봄[見]’에서, 더 나아가 보는 것, 다시 말해 그 너머를 본다는 것[觀[에 대해선 어떻게 표현할지 그 과학적 단서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뇌과학에서 의식/마음 관련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마음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뇌과학 일반에서 말하는 의식(consciousness)이란 말에는 주로 깨어 있음/주의 집중하는 힘이란 의미가 다분하다. 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의식/마음의 개념은 그것의 광대무변함이나 그것의 본질적 성품이 어떻다는 등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다.
사실 대승불교/선불교에서는 시각으로 본다[見]는 것에 ‘진실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상을 시각적으로 본다는 일상적인/일차적인 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각적 봄보다는 오히려 의식/마음으로 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각찰(覺察)의 봄, 깊이 잘 살펴본다는 뜻에서 봄[觀]이 그것이다. 즉 시각이라는 시각적 관점을 빌리지만, 실은 직심(直心)으로 사물/법을 본다는 말이다. 뇌과학에선 없는 표현/말이다.
선(禪)에선 ’본다[見]’는 말을 빌려, 이와 같이 말한다. 진심/본래 마음을 본다는 것[觀]은 결국 본래의 우리 마음이 진공(眞空)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엔 동시에 묘유(妙有)로서, 온갖 공덕들이 원래부터 원만히 갖춰져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것을 보지 않거나 보지 못하면, 초월/자비/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능히 갖춰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다.
관(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는 바로 관심/관법을 줄인 말이다. 관법이란, 가령 의식의 대상 경계[六境]로 들리는 소리(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이라고 칭명(稱名)하는 염불수행을 포함하여)를 진여본성이 듣고 자각하는 것, 다시 말해 중생심의 소리를 자각하여, 듣고 있음 그 자체의 주인공이 바로 진공/불성/불심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이근원통(耳根圓通)이라고도 한다. 또 시각적 봄을 관한다는 것은, 봄 자체를 자각하는 순수 의식이 활달하게 살아 있음을 알아채 ‘이놈’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앎에 이른다는 말인데, 그럼으로써 바야흐로 대상 경계가 사라지는(사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은 幻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달아), 진여일심의 지혜를 터득도 하게 된다는 도리를 두고, 관 혹은 관심/관법이라 부른다.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본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지 않는 상태[不見相]가 아니다.” 즉, 본다고 하는 시각적인 작용이 객관적인 사물에 속하지 않는다면, 사물을 대상으로 본다[見]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도[不見]도 볼 수가 없다. 만약 대상 경계로 보지 못하는 곳[不見處]을 본다면, 그것은 보지 않는 상태[不見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더듬듯 다시 살펴보자. 즉, 보지 못하는 곳(眞空, 진여본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見]와 못 본다[不見] 하는 일을 모두 초월하는 일로, 보지 못하는 곳을 보게 되면, 바야흐로 (그 직접적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아(개체)의식/통상의 지각작용/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보고, 듣고, 인식하는 견문각지(見聞覺知)는 마치 환화(幻化)와 같아 허망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법한 한 어구이다.
잘 알려졌듯 중생심/뇌의 지각작용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일은 근본적인 인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지(無智)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시각적 앎이란, 물론 안다와 모른다고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바른 앎이 아닌 것이다. 뇌 신경회로에서 보듯, 시각적 인지의 과정에서 부해마 영역에서 비롯된 개인적 감정이나 왜곡된 기억의 투사로, 대상 경계/사물에 대한 바른 인지/인식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이는 마치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오인한다는 옛 비유를 연상시키는데, 우리의 시각 신경 체계로는 늘 세계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이런 시각정보[見]에 대한 무지는 뇌과학 연구에서 보듯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며, 대승불교에서는 이미 그런 봄(사적인 투사가 된 봄)에 편견/무지가 있음을 오래전부터 많은 비유를 통해 드러내 왔다.
경전에 “만약 내가 대상 경계로 보지 않는 곳을 그대도 대상 경계로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지 않는 것은 대상 경계의 사물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미 보지 않는 곳을 대상 경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보는 주체인 본성은 객관적인 대상 경계의 사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존은 아난에게 진여본성은 객관적인 대상 경계의 사물이 아니고, 사물을 보는 시각 인식의 주체가 “바로 그대의 진여본성이다.”라고 설했다. 자아의식(주, 객이 분리된 개체의식)의 견해로 대상 경계를 볼 때, 자신의 견해로 보는 것은 진정한 정법안목의 견해가 아니다. 진정한 정법안목의 견해는 마치 자아의식의 삿된 견해를 여의고, 삿된 견해가 미치지 못하는 경지인데, 어찌 다시 인연(因緣)이다, 자연(自然)이다, 화합(和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봄’에 대해 이런 중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인과를 중요 법으로 여기는 소승불교(전통 인식론)와 인과를 무시하진 않지만 인과를 초월한 대승불교의 차이를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
진심/(순수)의식만이 실재한다는 게 대승/선의 입장이다. 일체는 실재하지 않고 자성이 없다. 그러므로 대승/선에서는 ‘봄’의 주인은, 개체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진심/의식이라는 것이다. 관[觀]을 통한 체험으로 진실성/믿음은 보다 확고해진다. 관자재보살도 오온이 공한 것을 관한 즉, 오온에 일체 자성이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온갖 고(苦)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봄’의 주인을 불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경우 현존 혹은 전체성이라 부르기도 할 것이다. 어떤 말로 ‘이것’을 부르든 ‘거기’에는 물론 그런 용어/의미/흔적도 없을 터다.
《대승기신론》에서 진여법신의 지혜는 일체의 언어(言說相), 명칭(名字相), 중생심의 반연(心緣相)을 초월한 경지라고 설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식(眞空, 진여법신)을 두고, 선종(禪宗)에서는 신령스러운 거울로 비유한다. 거울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에 대한 망심(妄心)을 텅 비운 무심의 경지에서, 보는 작용[見]과 보지 않는 작용[不見], 비추는 작용[照]과 비추지 않는 작용[不照], 즉 지(知)와 무지(無知), 긍정과 부정, 사량(思量)과 불사량(不思量)을 모두 초월하여, 여여부동(如如不動)한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일체의 사물을 여실하게 비춘다는 것이다.
공(空)의 마음/순수 의식은 단멸/허무의 공이 아닌 것이다. 직심은 봄[見]과 각찰하여 봄[觀] 둘 다를 포함하여 봄이다. 보는 마음의 주체는 견문각지로 일상의 지혜로 늘 활동한다는 것을 앎이다. 일체를 포섭하면서 이를 초월하되 항시 이 자리에 뚜렷하게 현전하여 항상 성성적적(星星寂寂)하게 깨어 있는 하나인 ‘그것’뿐임을 스스로 앎이다. 마땅히 이런 관[觀]에 관하는 자가 있을 리 없다.
6. 맺는말
뇌과학에서 본다는 일은 비유컨대 우리의 눈은 10여 대의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사진기들이 계속 ‘풍경’을 찍어대는 것이다. 사진기들은 시간 차이를 두고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상위단계로 전송한다. 영화는 1초에 20여 장의 정지된 화면을 연속으로 돌리게 되어, 하나의 동영상으로 보이게 한다. 우리의 뇌는 영화의 동영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각기 ‘풍경’을 찍어낸다. 우리 역시 그 연속된 정지화면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일정한 지각이나 ‘풍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요컨대 실은 밖의 사물이 연속해서 바뀐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의 인지/인식이 찰나로 나타났다가 찰나로 사라짐을 의식하지 못한 채, 대상 경계가 마치 지속적으로 실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점에서 보는 것은 정적인 것이다. 밖의 세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마음 안에 표상되는 바를 통해, ‘나름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봄[見]의 실상이다. 뇌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된 세계, 대개가 그런 ‘허상’을 보는 것이다.
대승불교는 시각적 봄을 실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시각적 봄에 대한 자각을 촉구한다. 시각적 봄이라는 가능한 봄을 통해 그 봄 자체를 보는 것, 다시 말해 시각 인식의 주체를 주의 깊게 각찰(覺察)/관(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 삶의 주인공은 ‘누구’가 아니며,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시각적 봄에는 진정 내가 보는 아니라 가아(假我)인, 이야기하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채게 됨이다. 들음에서도, 느낌에서도, 생각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나’ 너머에서 보고, 듣고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자각/관(觀)해야 한다는 것이 대승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
신승철 igu1848@hanmail.net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미국 텍사스의대 정신보건 연구교수,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 등 역임. 정신건강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이며 시인. 주요 논문으로 〈한국인의 자살〉 등과 저서로 《연변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역서로 《아직도 가야 할 길》 등 다수와 시집 《기적 수업》 수필집 《나를 감상하다》 등이 있음. 현재 블레스병원 원장이며 연세대 의대 외래교수
양자역학과 불교 :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과 무아의 연기(緣起) / 양형진
- 기자명 양형진
- 입력 2024.09.06 20:54
- 수정 2024.11.11 22:21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개요
양자역학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이론을 포함하여 현대물리학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된다. 양자역학은 뉴턴역학과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는데, 그 대부분은 측정과 연관돼 있다. 이 글에서는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duality)과 스핀 측정에서 나타나는 측정 결과의 범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범주는 대상과 무관하게 관측자의 의도로 설정된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가 측정 결과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대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대상의 상태를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측정에 대한 우리의 소박한 믿음은 여기서 무너진다. 이에 이어, 관측자가 참여하는 측정의 이런 구조는 양자역학뿐 아니라 일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현상은 대상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관이 객관과 어떤 연기적(緣起的) 맥락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기에 의해 색성향미촉법(色聲響味觸法)이 또렷이 나타나도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響味觸法)이고, 업(業)에 의해 수많은 현상이 나타나도 업자(業者)가 없는 무아(無我)의 연기공(緣起空)임을 논하고자 한다.
1. 양자가설과 양자역학
영(Thomas Young)이 이중슬릿을 이용하여 빛이 간섭(inter-ference)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빛이 파동이라는 것은 자명했다. 빛이 전자기 파동이라는 사실은 고전 전자기학인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되고, 헤르츠의 실험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빛은 파동의 전형적인 현상인 간섭과 회절(diffraction)을 보여주므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흑체복사(blackbody radiation)나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 콤프턴 효과(Compton effect)처럼 고전 전자기학의 파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플랑크(Max Planck, 1858~1947)는 1900년에 양자(quantum)가설을 제안했다.
양자는 우리말로는 ‘덩어리’ 혹은 ‘알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소립자, 원자, 빛 알갱이인 광자(光子, photon) 등이 모두 양자다. 양자역학은 우주가 이런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탄소 2kg에 10조 곱하기 10조 개의 탄소 원자가 들어 있을 정도로 양자는 아주 작다. 원자가 이렇게 작으므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원자를 보거나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구가 30와트의 노란빛을 발산한다면 1초 동안에 100억 곱하기 100억 개의 광자가 방출된다. 이처럼 광자 수가 많다는 것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그만큼 작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세하므로 우리는 빛을 알갱이라고 느끼지 못한다.
양자가설에서 출발하는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의 동역학(dynamics)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기본 이론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낸 가장 정확한 과학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양자역학은 입자물리, 원자물리, 고체물리, 양자장(quantum field) 이론, 양자화학 등 거의 모든 물리학 분야의 기초가 된다. 양자가설을 이용하여 흑체복사와 광전효과와 콤프턴 효과가 설명됐다. 이런 현상은 빛을 양자라고 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양자역학은 양자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제공하고, 양자암호와 양자통신을 아우르는 양자정보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2.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고전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은 그 물리적 속성이 전혀 다르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어서, 입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 없고 파동은 입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 입자인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할 수 없고, 파동인 빛은 입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 이와 전혀 다른 상황이 양자역학에서 전개됐다. 양자역학은 빛을 입자라고 가정하는 양자가설에서 출발한다.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전에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회절무늬를 보이면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를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wave-particle duality)이라고 한다.
광전효과에서는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더라도,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빛은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는 빛이 사실은 입자인데, 과거에 파동이라고 잘못 알았던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고전물리학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빛이 파동이었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입자라는 것이 아니다. 고전물리학에서는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현상만 알았지만,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플랑크가 양자가설을 세우면서 양자역학이 시작됐지만, 지금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빛은 파동처럼 행동한다.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다
광전효과를 통해 이중성을 살펴보자. 광전효과란 빛을 쪼이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원자에 갇혀 있던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를 탈출하고,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른다. 만약 빛이 파동이라면, 아주 오랫동안 빛 에너지를 모아야 전자가 탈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빛을 쬐고 10억분의 1초가 지나지 않아 전자가 튀어나온다. 빛 에너지가 파동처럼 공간에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입자처럼 한 점에 모여 있다가 고스란히 전자에 전달된다는 것이다. 광전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에 빛이 입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 빛은 이 순간 이전엔 파동처럼 행동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입자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 빛이 입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순간 입자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상적 세계와 달라진다.
일상적 세계에서 측정은 잔고 확인과 같다. 백만 원의 잔고를 확인한다는 것은 확인 전에 백만 원이 계좌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상 세계에서 측정은 측정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이 명백한 일이 양자역학에서는 달라진다. 지금 입자로 측정됐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입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하기 전에 입자여서 입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입자여서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입자로 행동했을 뿐이다. 파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측정하기 전에 파동이었던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파동인 것도 아니며, 단지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파동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를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다시 살펴보자.
이중슬릿 실험에서의 이중성과 본질
광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한다고 하자. 빛의 세기를 줄여서 1초에 광자 하나를 방출하는 정도로 지극히 약한 빛을 보낸다고 하자. 슬릿 두 개를 모두 열어 놓으면, 하나의 광자만 슬릿을 지나도 두 파동이 더해지는 것처럼 간섭무늬가 생긴다. 이는 실험적 사실이다. 이 경우엔 두 슬릿이 모두 열려 있으므로 광자가 어느 슬릿을 지났는지를 모른다. 이처럼 광자의 경로를 모르면 간섭무늬가 생기면서 파동처럼 행동한다. 이와 달리, 슬릿 하나를 닫고 하나만 열어 놓으면 광자는 열린 슬릿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광자의 경로를 알면 간섭무늬가 생기지 않으면서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 역시 실험적 사실이다.
이를 정리해 보자. 슬릿 하나만 열어 놓으면, 간섭무늬가 사라지면서 입자성이 드러난다. 슬릿 둘을 모두 열어 놓으면, 간섭무늬가 생기면서 파동성이 드러난다. 장치를 바꾸는 데 따라 입자나 파동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빛을 본질적으로 파동이나 입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스핀으로 보는 양자 측정의 구조
우리 주변에 널린 자석, 자기쌍극자
고전 전자기학에 의하면,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이므로, 정지한 전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든다. 움직임의 특별한 경우가 원운동이다. 전하가 원운동을 하거나 원형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막대자석 같은 자석이 된다. 전자석이 좋은 예다. 지구 자기장도 지구 외핵을 흐르는 유체가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가 큰 자석이라면 나침반은 작은 자석이다. 지구나 전자석과는 다르게, 나침반은 구성 요소의 양자역학적 특성 때문에 자석이 된다. 어떤 경우건, N극과 S극의 두 자극이 만들어지면 이를 자기쌍극자(magnetic dipole moment)라고 한다. 자기쌍극자는 우리 우주에 아주 흔히 존재한다. 가까이에는 나침반 같은 영구자석, 전자석, 지구 등이 있다. 멀게는 수많은 항성과 행성, 위성에서 자기쌍극자가 관측된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양자역학에서 나왔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의 기본입자가 자기쌍극자를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회전하지 않는 작은 자석 스핀
양자역학에서는 기본입자의 자기쌍극자를 기술하기 위해 스핀각운동량(spin angular momentum) 혹은 줄여서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도입한다. 각운동량은 회전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물리량이다. 스핀이란 단어에도 회전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정황과 달리, 스핀은 회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전하가 공전(revolution)하거나 자전(rotation)한다는 것이 아니다. 크기가 점처럼 작은 전자는 아무리 빨리 자전해도, 관측되는 자기쌍극자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스핀이 공전이나 자전과 상관없다는 것은 중성자에서 명확해진다. 전하가 없는 중성자는 어떤 회전운동으로도 자기쌍극자를 만들 수 없지만, 양성자나 전자처럼 자기쌍극자를 갖는다. 이처럼 전하의 회전운동으로는 스핀을 설명할 수 없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같은 기본입자는 그 자체로 자기쌍극자다. 그래서 스핀을 본질적 각운동량(intrinsic angular momentum)이라고도 한다. 스핀은 철저하게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다.
관측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측정치의 범주
기본입자인 전자의 스핀 측정을 통해 양자 측정의 특성을 살펴보자. 전자의 스핀이 향하는 방향을 측정한다고 하자. 3차원 공간에는 무한히 많은 방향이 있지만, 나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상하’의 세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3차원 공간에서 x, y, z의 세 축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측정과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서도 측정 이전에 측정할 대상과 측정할 물리량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는 관측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치타의 속도나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려는 경우, 치타나 전자가 측정할 대상이고 속도나 스핀이 측정할 물리량이다. 측정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일상적인 측정과 같지만,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서는 양자역학이 일상적인 측정과 상당히 다르다. 이를 살펴보자.
먼저 전자의 스핀이 ‘상하’의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하자. 스핀의 ‘상하’ 방향을 측정하면, ‘위’ 혹은 ‘아래’의 방향이 관측된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up’과 ‘down’이라고 한다. 왜 두 값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전자를 측정하면 언제나 ‘up’과 ‘down’의 두 값만 나온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핀의 ‘전후’ 방향을 측정하면 ‘앞’ 혹은 ‘뒤’라는 방향이 관측되고, 스핀의 ‘좌우’ 방향을 측정해도 ‘좌’ 혹은 ‘우’라는 방향이 관측된다. 이런 식으로 관측된다는 사실이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고전역학과는 아주 다르다. 고전역학이라면 스핀이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전후나 좌우 방향을 측정하면 그 갑이 0이어야 한다. 고전역학에서는 전후나 좌우 방향을 측정한다고 해서 위로 향한 스핀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이 대상의 상태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 전제가 양자역학에서는 전적으로 무너진다. 양자역학은 이 점에서 고전역학과 전혀 다르다. ‘위’로 향한 스핀에 대해 ‘전후’ 방향을 측정하면, ‘앞’이나 ‘뒤’를 향한 스핀이 관측된다. 양자역학에서 ‘상하’나 ‘전후’나 ‘좌우’ 중의 하나를 관측하면, 각각 ‘위/아래’나 ‘앞/뒤’나 ‘좌/우’로 관측된다. 이처럼 이전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 결과가 나온다. 고전역학과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지금 무엇을 측정하는지만이 중요하다.
이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관측하려고 하는 관측자 의도에 따라 관측 결과인 스핀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관측이라면 관측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무너진다. 양자 측정에서는 관측자의 의도에 따라 측정치의 범주가 설정되고, 관측을 통해 그 범주 중의 하나가 측정치로 나타난다.
양자 측정과 힐베르트 공간
이런 실험적 사실을 체계적이고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양자 이론이다. 이런 점에서 양자 이론이란 관측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체계의 출발점은 관측자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려고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측정하려는 물리량에 대응하는 에르미트 연산자(Hermitian operator)가 정해지고, 이 연산자의 고유치(eigenvalue)의 집합(set)과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벡터(eigenvector)의 집합이 정해진다. 이 고유벡터의 집합으로 전개되는 벡터의 집합을 힐베르트 공간(Hilbert space)이라고 한다. 고유치의 집합 중의 하나가 측정치가 된다. 이 측정된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벡터가 측정 후의 상태가 된다. 이는 측정치의 범주(category)가 고유치의 집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며, 측정 후의 상태는 고유벡터의 집합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줄이면, 측정하려는 물리량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측정치의 범주와 측정 후 양자 상태의 범주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지, 즉 ‘전후’ ‘좌우’ ‘상하’ 중에 어떤 측정을 할지는 관측하기 전에 관측자가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다. ‘전후’ 측정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앞’이나 ‘뒤’라는 측정값이 나타나고, ‘상하’ 측정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위’나 ‘아래’라는 측정값이 나타난다. 관측자가 ‘전후’ 측정을 하려고 하면, ‘앞’이나 ‘뒤’라는 측정값의 범주가 결정되고 이 둘 중의 하나가 측정을 통해 나타난다. 이처럼 측정값은 관측을 통해 드러나지만, 측정값의 범주는 관측자가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연속적인 스핀 측정
측정값의 범주가 관측 전에 정해진다는 사실 때문에 연속적인 측정에서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다. 처음에 ‘전후’를 측정했고, 측정값이 ‘앞’이었다고 하자. 다시 ‘전후’를 측정하면 ‘앞’이라는 측정값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실험적 사실 때문에, 측정 후의 양자 상태를 ‘앞’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자의 스핀은 앞으로 향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대해 ‘전후’가 아닌 다른 측정을 하면 일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난다.
‘앞’ 방향은 ‘위/아래’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다. ‘앞’ 방향이 ‘위/아래’가 아니므로, 고전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상하’를 측정했을 때 ‘위’나 ‘아래’라는 측정값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나 ‘상하’의 2차 측정을 하면 이 측정이 설정하는 측정값의 범주인 ‘위/아래’ 중의 하나가 관측된다. 이는 ‘좌우’ 측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좌/우’ 중의 하나가 관측된다. 어떻게 ‘앞’으로 향했던 스핀이 ‘위/아래’나 ‘좌/우’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고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세 번째로 ‘전후’ 측정을 한 번 더 한다고 하자. ‘전후’의 1차 측정에서 ‘앞’이 관측됐고, ‘상하’의 2차 측정에서 ‘위’가 관측됐다고 하자. ‘전후’의 3차 측정을 하면 ‘앞’과 ‘뒤’가 관측될 확률이 50%로 같다는 것이 실험적 사실이다. 처음 측정에서 ‘앞’으로 관측됐던 전자가 세 번째 측정에서는 ‘앞’과 ‘뒤’ 어느 방향으로도 관측된다는 것이다. 1차 측정에서 ‘앞’이 관측됐는데, 3차 측정에서 어떻게 ‘뒤’가 관측될 수 있는가? 이 역시 고전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엔 두 가지 원리가 개입한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관측자에 의해 측정치의 범주가 설정됐기 때문이다. ‘상하’의 2차 측정에서 ‘위’가 관측됐다거나, ‘전후’의 3차 측정에서 ‘앞’이나 ‘뒤’가 관측된다는 것은 무엇을 측정할지를 결정하면서 측정값의 범주가 만들어졌고 이 범주 안에서 측정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불확정성원리(uncertainty principle) 때문이다. 이를 살펴보자.
양자 측정과 불확정성 원리
태양 주위를 행성이 공전하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얼핏 보면 이 둘은 아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행성과 달리 전자는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의 궤도는 전혀 다르다. 왜 그런가? 수만 년 후에 행성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는 행성이 어떤 원리로 운행되는지를 몰랐던 뉴턴 이전의 시대에도 가능했다. 지금까지의 관측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전자는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치를 측정하는 행위 때문에 위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uncertainty principle)이다. 이에 따르면 위치와 속도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치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속도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속도를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진다. 고전역학이 전제하는 것처럼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속도의 불확정이 커져서 운동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측정 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궤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자의 위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전자구름(electron cloud)처럼 확률분포로만 표시할 수 있다.
불확정성원리는 스핀 측정에도 적용된다. 서로 연관된 두 물리량의 상태를 동시에 알거나 규정할 수 없으므로, 스핀의 어느 한 방향이 ‘up’이나 ‘down’이라는 것을 안다면 스핀의 다른 성분이 어느 방향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전후’의 1차 측정에서 ‘앞’이 관측됐다 하더라도, ‘상하’의 2차 측정에서 ‘위’가 관측됐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1차 측정에서 얻은 ‘앞’이라는 정보는 사라진다. 이는 1차 측정에서 얻었던 ‘앞’이라는 정보가 관측자에게만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 관측자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스핀 자체를 ‘앞’이면서 동시에 ‘위’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차 측정을 하면 1차 측정의 결과가 말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3차 측정 결과는 1차 측정 결과와 전혀 상관없다. 1차 측정 결과는 3차 측정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후’의 1차 측정에서 ‘앞’ 상태라는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3차 측정에서 1차와 같은 ‘전후’ 측정을 하더라도 ‘뒤’ 상태가 관측될 수 있다.
4. 연기(緣起)로 나타나는 현상에서의 무색성향미촉법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나 스핀의 측정 등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고전물리학이나 일상 세계에서의 측정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일상의 측정에서는 측정이 측정하기 바로 전의 상태를 보여줘야 한다. 잔고 확인은 잔고를 확인하기 바로 전의 잔고를 보여준다. 특히 측정 자체가 측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 잔고를 확인했다는 사실에 의해 잔고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일상의 측정에서는 특이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조금 전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와 같고 지금의 상태가 조금 후의 상태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측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진다. 양자 세계가 당혹스러운 것은 이 믿음이 사라진다는 데에 있다. 양자 세계가 일상 세계와 다른 또 하나는 어떤 맥락에서 누가 관측하느냐에 따라 대상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측정 결과로 나타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는 첫 번째 차이점과 깊이 연관돼 있다. 양자 측정에서의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자.
양자는 파동으로 나타나도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나타나도 입자가 아니다
하나의 빛이 이중슬릿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흑체복사나 광전효과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중슬릿에서 파동처럼 행동하면서 흘러나온 그 빛을 금속에 쪼이면 광전효과를 일으키면서 입자처럼 행동한다. 고전물리학이나 일상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우리는 어떤 존재자의 본질(essence)에 의해 그 존재자의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본질이 그러므로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처럼 행동하고,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한다.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빛을 파동이라고 단정하고,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빛을 입자라고 단정하려고 한다. 행동을 보고 존재를 규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이 당연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슬릿 실험을 포함하여 대부분 상황에서 빛이 파동처럼 행동하더라도, 광전효과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므로 빛을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빛이 파동이라면 광전효과에서도 파동처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상황에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전효과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광전효과에서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더라도, 대부분 상황에서 파동처럼 행동하므로 빛을 입자라고 할 수는 없다. 빛이 입자라면 대부분 상황에서도 입자처럼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광전효과에서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경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해서 파동이라고 할 수 없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해서 입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빛은 무엇인가?
스핀은 위로 나타나도 위가 아니고 아래로 나타나도 아래가 아니다
빛을 통해 본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 문제와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스핀 측정을 살펴보자. 스핀 측정은 이중성보다 더 명확하게 본질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스핀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 전자의 스핀을 측정한다고 하자. 삼차원 공간에서 스핀이 향할 수 있는 방향은 무한히 많으므로, 스핀이 정확하게 ‘위’나 ‘아래’ 방향을 향해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관측에 의하면, ‘상하’ 측정을 하여 ‘위’나 ‘아래’ 방향이 관측될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이는 스핀의 ‘상하’를 측정하여 ‘위’ 방향이 관측됐다 하더라도, 측정 전에 ‘위’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빛이 이중슬릿에서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빛을 파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이중성이나 스핀 측정이나 모두 측정이 측정 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고전역학이나 일상적인 측정과는 다르게, ‘위’ 방향이었기 때문에 ‘위’ 방향으로 관측되는 것이 아니고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다. 이는 연속적인 측정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이전과 같이 처음에 ‘전후’를 측정했고 ‘앞’을 관측했다 하자. 다시 ‘전후’를 측정하면 ‘앞’이라는 측정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실험적 사실 때문에, 이 스핀은 ‘앞’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하’를 측정한다고 하자. 고전 측정이라면 ‘앞’은 ‘위’나 ‘아래’의 방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하’를 측정했을 때 ‘위’나 ‘아래’로 측정되면 안 된다. 그러나 양자 측정에서는 ‘위’나 ‘아래’로 측정될 확률이 각각 50%다. ‘위’의 상태였기 때문에 ‘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앞’의 상태였는데도, ‘위’나 ‘아래’로 관측된다. 주인이 부르면 그 방향으로 개가 달려오듯이, ‘상하’ 측정을 하면 스핀이 ‘위’나 ‘아래’로 정렬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전후’의 1차 측정에서 ‘앞’이 관측됐고, ‘상하’의 2차 측정에서 ‘위’가 관측된 상황에서 ‘전후’의 3차 측정을 다시 한다고 하자. 3차 측정에서 ‘아래’가 50%로 관측된다는 실험적 사실은 3차 측정의 결과가 이전의 측정 결과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보는 것은 객관 자체가 아니라 주관이 참여하면서 드러나는 객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이나 스핀 측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고전역학이나 일상에서의 측정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빛은 광전효과라는 상황을 만나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이중슬릿 장치를 만나면 파동처럼 행동한다. 전자의 스핀은 ‘상하’를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나타나고, ‘전후’를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앞/뒤’로 나타나며, ‘좌우’를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왼쪽/오른쪽’으로 나타난다.
이중슬릿 장치에 변화를 주면 빛의 행동이 달라진다. 두 슬릿을 모두 열어 놓으면 빛은 언제나 파동처럼 행동한다. 두 슬릿 중의 하나를 닫으면, 파동처럼 행동하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을 바꾼다. 이처럼 내가 관측 장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빛의 행동이 바뀐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관찰자의 개입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관측 결과는 객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주관이 관여한 객관의 모습이다. 주관이 참여하면서 그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 객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주관과 객관 사이에 설정된 관계의 맥락, 연기(緣起)의 맥락에 따라 객관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양자역학의 이론 체계다. 스핀의 ‘상하’를 측정하려고 하면 ‘상하’ 측정에 대응하는 힐베르트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벡터 공간은 측정 결과의 범주를 ‘위/아래’로 한정한다. 무엇을 측정하려는 것인지 관측자의 의도에 따라 측정 결과의 범주가 결정된다. 관측자가 ‘상하’ ‘전후’ ‘좌우’ 중의 어느 방식으로 측정을 하려는지에 따라 측정 결과의 범주가 각각 다르게 설정된다. 전자의 스핀 자체가 측정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측자의 의도에 따라 설정된 범주 중의 하나가 측정 결과로 나타난다. 관측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 측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관념이 양자역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측자의 의도에 따라 측정값의 범주가 정해지는 것이 스핀만은 아니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물리량이 전부 그렇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의 측정은 대상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주관이 측정값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렇게 설정한 영역 안에서 대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객관적 관측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면서 참여하는 관측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측정을 더 타당하게 묘사하는 것일 수 있다.7)
남도봉과 북도봉으로 나타나는 참여하는 관측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도봉산이 나타나는 모습과 같다. 도봉은 하나지만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산의 모습이 달라진다. 하나의 도봉이 북한산 백운대에서 보면 남도봉이 되고, 의정부에서 보면 북도봉이 된다. 양자는 상황에 따라 입자나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한 측정에서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스핀은 상황에 따라 ‘위/아래’ ‘앞/뒤’ ‘왼쪽/오른쪽’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 측정에서 여러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남도봉과 북도봉이 나타나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 남도봉과 북도봉을 동시에 볼 수는 없다. 백운대에서 남도봉이 나타나면 북도봉이 사라지고 의정부에서 북도봉이 나타나면 남도봉이 사라지는 것처럼, 광전효과에서 입자성이 보이면 파동성이 사라지고 이중슬릿에서 파동성이 보이면 입자성이 사라지며, 스핀을 ‘상하’로 측정하면 ‘앞/뒤’나 ‘왼쪽/오른쪽’의 모습이 사라진다.
어느 곳에 가서 도봉을 보느냐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양자를 측정하느냐와 같다. 광전효과를 측정할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빛이 나타나고 이중슬릿에서는 파동처럼 행동하는 빛이 나타나며, 스핀의 ‘상하’를 측정하면 ‘위/아래’로 향한 스핀이 나타나는 것처럼, 의정부에서 보면 북도봉이 보이고 백운대에서 보면 남도봉이 보인다. 내가 어떤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빛이나 스핀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가서 도봉을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도봉의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측정을 하느냐는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일인 것처럼, 어디에 가서 도봉을 보느냐는 도봉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일이다. 내가 어떤 실험적 맥락, 어떤 상황적 맥락, 어떤 연기적 맥락을 맺으면서 대상을 보려는지에 따라 입자나 파동이 나타나고, ‘위/아래’나 ‘앞/뒤’가 나타나며, 남도봉이나 북도봉이 나타난다. 양자의 세계와 같이 일상 세계에서도 어떤 참여를 하느냐, 어떤 연기적 맥락을 맺느냐에 따라 대상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파동을 만나려면 이중슬릿 실험을 해야 하고, 입자를 만나려면 광전효과를 보면 되고, 스핀이 ‘위/아래’로 향한 것을 보려면 ‘상하’를 측정하면 된다. 남도봉을 보고 싶으면 백운대에 오르고 북도봉을 보고 싶으면 의정부로 가면 된다.
사과와 무지개와 양자가 보여주는 무색성향미촉법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자. 앞에 놓인 빨간 사과를 본다고 하자. 사과를 본다는 과정은 사과에서 붉은색 파장의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가 나오면서 시작된다. 전자기파가 내 눈의 수정체를 거쳐 망막에 도달하고, 그 에너지가 망막 신경을 자극하고, 이 자극을 시신경이 뇌로 전달하고, 이를 시각중추가 해석함으로써 물체의 모습과 색이 나타난다. 시각중추가 해석하기 전까지는, 전자기파의 파동과 시신경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이 있을 뿐 붉은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자기파라는 인(因)이 수정체, 망막, 시신경, 뇌 등의 연(緣)을 거치면서 안식(眼識)이라는 과(果)가 나타난 것이다. 시각중추가 해석할 수 있는 색깔이 가시광선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안식도 그 관측 결과의 범주가 정해진다. 이 관측 범주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 빨간색을 볼 수 없는 생명체에게는 사과가 빨갛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과는 빨간 것인가? 아니다. 빨갛게 보이더라도 사과는 빨간 게 아니다. 우리에게 빨갛게 보일 뿐이다. 빨갛게 나타난 그건 빨간 게 아니라 우리 시각중추가 빨갛게 그려낸 것이다. 빨간 사과는 없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태양에서 온 빛이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 안에서 두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면서 빛이 분리된다. 이 분광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빛깔의 빛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어느 물방울이든 모든 색의 빛을 다 뿜어내지만, 나와 태양과 물방울의 위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어느 한 물방울에서 나온 여러 색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색만 보게 된다. 그 기하학적 위치 설정에 따라 무지개가 나타난다. 일곱 빛깔의 무지개가 나타나더라도 각각의 물방울은 모든 색을 다 뿜어내므로, 빨갛게 보이는 하늘의 물방울은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하늘의 물방울도 보라색이 아니다. 무지개가 7가지 색으로 보여도, 무지개를 만드는 물방울은 그 어느 색도 아니다. 모든 색이 포함된 무색(無色)이다. 빨강도 보라도 아닌 무색이지만 맺어진 연기의 맥락에 따라 빨강으로 보이기도 하고 보라로 보이기도 한다. 무색이지만 무지개가 나타난다. 무지개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가 무색이고, 무색인 바로 그 자리에서 무지개가 나타난다.
5. 업(業)은 있어도 업자(業者)는 없는 무아의 연기공
주관이 설정한 범주 안에서 객관의 모습이 나타난다
양자역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감각이 세상을 보는 데에도 측정값의 범주가 존재한다. 우리 눈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만 볼 수 있고, 우리 귀는 가청주파수 영역의 소리만 들을 수 있다. 모든 감각기관이 다 그렇다. 우리가 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측정값의 범주 안에서 드러나는 대상의 모습이다. 감각 경험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 범주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각 경험에는 수십억 년 동안 진행돼 온 감각기관의 진화 과정이 스며들어 있다. 서로 다른 생명체는 각기 다른 진화의 경로를 밟아왔기에, 감각기관이 감지하는 영역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비가 볼 수 있는 색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돌고래나 고등어에게 짜지 않은 바닷물이 우리에게는 짜다. 양자역학에서만 힐베르트 벡터 공간으로 관측의 범주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도 감각의 범주가 설정돼 있다. 백운대나 의정부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감각 범주다. 이렇게 몸에 각인된 감각 범주로 우리는 세상을 본다. 이렇게 일상적인 감각 경험에서 주관이 참여하는 정도는 양자역학에서 주관이 참여하는 정도보다 오히려 더 클 것이다.
업은 있어도 업자는 없는 무아의 연기공
이중슬릿 실험에서 빛이 파동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빛을 파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파동으로 보일 뿐 파동은 아니다. 광전효과에서 빛이 입자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빛을 입자라고 할 수는 없다. 입자로 보일 뿐 입자는 아니다. 스핀의 ‘상하’ 측정에서 ‘위’로 관측돼도 스핀 자체가 ‘위’는 아니다. 단지 ‘위’로 보일 뿐이다. 남도봉으로 나타나도 남도봉이 아니고 북도봉으로 나타나도 북도봉이 아니다. 다만 도봉일 뿐이다. 바닷물은 짜게 느껴지지만 짠 게 아니고, 사과는 빨갛게 보이지만 빨간 게 아니며,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색깔의 물방울은 어디에도 없다.
이 모두는 맥락이 설정되는 관측 경험의 범주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연기(緣起)로 나타난 것이다. 나타나는 그게 어디에도 없으므로 무색성향미촉법(無色聲響味觸法)의 무아(無我)이고, 단지 연기에 의해 나타나므로 공(空)이다.8) 오온(五蘊)이 연기이고 오온이 공이다. 이게 세간(世間)이다.
파동으로 나타나도 파동인 건 없고, 입자로 나타나도 입자인 건 없으며, ‘위’로 나타나도 ‘위’인 것은 없다. 빨갛게 보여도 빨간 건 없고, 짜게 느껴져도 짠 게 없으며, 남도봉과 북도봉이 나타나도 남도봉과 북도봉은 없다. 파동, 입자, 빨강, 짬, 남도봉, 북도봉이 모두 연기에 의해 나타나는 업이다. 그 모든 업이 언제나 나타나도 업자는 없다. 무아의 연기공이다. ■
양형진 yangh@korea.ac.kr
서울대 물리학과(학사,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이론물리학 박사) 졸업. 양자정보이론 전공. 주요 논문으로 〈선과 과학에서의 평등과 차별, 중도〉 〈상대성이론과 무아와 무상〉 〈법계 연기에 대한 과학적 해석〉 〈진화하는 자연의 시공간적 연기 구조와 중도〉 등과 주요 저서로 《산하대지가 참빛이다-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등이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불교발전연구원장.
불교와 화학 / 강종헌
- 기자명 강종헌
- 입력 2024.09.06 20:59
- 수정 2024.11.11 22:21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들어가며
불교와 화학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현대 화학을 불교를 통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주의해야 함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화학은 물리적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창하고, 그를 활용하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순수 자연과학이다. 반면, 불교는 기본적인 마음챙김(sati)과 수행을 통하여 괴로움(dukkha)의 원인을 이해하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넘어서 보편적 중생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교는 일차적으로 인간 중심의 철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화학적 현상 그 자체를 단순히 불교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는 아님을 밝히며, 그러한 태도는 큰 논리적 비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화학이라는 자연과학 분야의 특성과 초기불교와 상호작용한 화학과 관련된 당대의 힌두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먼저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 화학의 다양한 측면 중 화학자의 일과 삶이 불교적 관점, 특히 《숫따니빠따》와 같은 초기불교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호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팔정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으로서의 화학(chemistry as practice)’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학문으로서 화학의 특성
먼저 ‘불교와 화학’을 논하기 전에 화학의 학문적 특성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화학은 물질적인 현상을 원자 및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다양한 물질들의 물리화학적 물성, 원자 수준의 미시적 구조, 그리고 화학결합이 끊어지고 생성되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화학반응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과학으로서의 화학은 옹스트롬(Å) 수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현상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명현상까지 이 세상을 이루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학적으로도 비료, 이차전지, 제약, 반도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화학산업까지 인류의 삶에 큰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화학은 크게 화학 현상들이 기반하는 물리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화학’, 탄소가 포함된 유기화합물들의 화학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유기화학’, 금속이나 광물과 같은 결정부터 유기금속 화합물까지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는 ‘무기화학’, 화합물이나 화학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분석화학 및 분광학’, 생체 내 화학 현상들을 연구하는 ‘생화학’, 양자역학 및 분자동역학에 기반한 컴퓨터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학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계산화학’과 같은 세부 분야들로 나누어진다. 이들 분야는 모두 유구한 학문 탐구의 역사가 있고, 각각의 과목명이 들어간 박사학위가 수여될 정도로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분야 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아가 유체역학이나 전자기학, 전달 현상 등 물리학의 세부 학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학공학이나 재료공학과 같은 공학 전공들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화학은 흔히 다른 자연과학 분야들인 물리학과 생물학의 중간에 자리한 학문으로 인식된다. 화학은 관심의 대상인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물리학의 이론을 활용하며, 생물학의 관심 분야인 생명현상의 기본이 되는 화학적 현상들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화학이 물리학의 하위 분야이고 생물학의 상위 분야라는 의미는 아니다. 화학은 인류의 복지와 생태와 지구 환경의 지속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어 순수 이론물리학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생물학의 모든 영역이 화학에 들어가는 것 또한 결코 사실이 아니다. 화학은 태생부터 학제 간 융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초의학, 환경과학, 재료과학에도 기여하고 있고, 인류의 생존 및 편의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에서 화학의 위치는 단순히 ‘중간 학문(intermediate science)’이라기보다, 많은 분야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중심 학문(central science)’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실제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다.
물론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은 태생부터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 학문 분야들을 막론하고 ‘스스로 그러한 것들(自然)’을 연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이 학문 분야가 구분되는 것은 과학사적 배경과 함께 사람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적 목적이 있으며, 일종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방법론에서 화학은 다른 자연과학 분야들과 궤를 같이한다. 20세기 들어 양자역학과 복잡계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긴 했지만, 화학은 그 시초부터 수학적으로 세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기계론적 세계관(mechanism), 그리고 정신(res cognitans)과 존재(res extensa)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다.
한편 불교는 무상(anicca), 무아(anatta), 그리고 인연(pratītyasa-mutpāda)에 기반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탐진치를 끊고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승불교에서 공(sūnyatā)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불교는 현대 자연과학이 기초한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이나 환원론적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화학과 불교는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모습을 이해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기본이 되는 전제와 인식,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화학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교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습, 즉 법(dharma)을 이해하여 수행자가 언제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알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더욱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당시 현대 화학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와 목적과 방법론이 다른 양자를 직접 병치하는 것은 유의미하고 직관적인 결론을 정리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초기불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힌두교의 자연관, 특히 현대 화학과 유사한 인식론에 근거한 바이셰시카 학파의 사상을 먼저 병행하여 소개하여 그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바이셰시카 학파와 화학, 그리고 불교
후기 베다 시대(later Vedic period,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는 갠지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이 상당한 발전을 이룬 시기이다. 갠지스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서 비롯되는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가들이 출현하였고, 인도 철학의 중추를 이루는 다양한 철학 학파들이 등장하였다.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원형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베다 시대에서 십육대국 시대로 넘어가는 기원전 5세기는 사문(沙門, 큦ramaṇa)으로 대표되는 수행 계층이 확립되었고, 베다를 인정하는 힌두교의 6정통파와 더불어 불교와 자이나교를 비롯, 인도 철학에 바탕을 둔 여러 종교의 교단이 실체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자연과 인간의 실재(reality)에 대하여 각 학파와 교단별로 다양한 인식론적 견지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집중되었다. 화학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학파는 힌두교의 6정통파 중 하나로서, 승론(勝論)학파로도 널리 알려진 바이셰시카(Visesikā) 학파이다. 바이셰시카 학파는 카나다(Kanada) 또는 카샤파(Kashapa)로 알려진 힌두교 승려를 교조로 하고 있으며, 다원주의적 원자론에 기초한 형이상학을 핵심 이론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불교와 화학’을 논함에서, 불교의 태동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물질적 구성을 인식하였는지 이해하기 위해 바이셰시카 학파의 사상을 소개하고 불교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맥락상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바이셰시카 학파는 기본적으로는 만물에 내재하는 변하지 않는 실체, 즉 아트만(atman)을 상정한 힌두교의 분파이며, 그 아트만의 일면으로서 초기 원자론을 주창하였다. 바이셰시카 사상은 관찰과 논리에 기반한 과학적 논증을 전개한다는 측면과 세상이 변하지 않고 쪼갤 수 없는 단위 입자(원자, paramanu)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측면에서 현대 화학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이셰시카 학파는 원자는 ‘땅’ ‘물’ ‘불’ 그리고 ‘공기’라는 4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원자들이 둘, 셋, 또는 그 이상 결합하여 더 복잡한 물질, 나아가 만물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발상은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Democritus)의 원자론을 한 세기 이상 앞선 것이며, 현대 화학에서 입증된 원소(element) 및 분자(molecules)의 존재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라는 시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바이셰시카 학파의 사상은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잘 정의된 환경에서 수행된 실험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진다. 바이셰시카 학파의 세계관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이나 입자가속기가 필요하나, 이는 모두 20세기에 개발된 것으로 당대에는 이를 입증할 여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양자물리학 및 분석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subatomic) 입자들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존재가 입증되었고, 이는 바이셰시카 학파나 데모크리토스가 주장하였던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는 고대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반박한다. 또한 바이셰시카 학파는 당대 인도와 그리스에 공통적으로 만연하였던 4원소설을 채택하였지만, 현대 화학에서 다루는 원소는 100종을 훨씬 넘는다. 바이셰시카 사상은 기본적으로 관찰과 논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현대 화학과 일맥상통하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입증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셰시카 사상은 과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에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상응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교는 시대적으로 힌두교의 바이셰시카 학파와 거의 같은 시기인 기원전 5~6세기경에 태동하였다. 초기불교는 기존 힌두교의 다양한 교단의 사상과 대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것은 변화하며(무상),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아, 즉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으며(무아), 만물과 그의 생멸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인연)는 것을 핵심 교리로 하였다. 특히 불교는 상기한 영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곧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바이셰시카 학파, 나아가 당대의 지배사상이었던 힌두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바이셰시카 학파가 원자들의 성질과 그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불교는 세상의 모습을 이해함으로써 탐진치를 끊어내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반(nirvana)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행의 일차적 목적도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교에도 자연과학적 차원의 세계관이 존재하며, 현대 화학에서 관심을 갖는 현상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도 그 내용과 결과적인 의미의 경중을 떠나 충분히 가능하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변화에 대한 학문이며, 모든 물질의 변화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anicca)’과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화학반응들은 열역학적으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진행된다. 이는 수면의 높이가 다른 수조 두 개를 수로로 연결하면 수면의 높이가 같아져 수압의 평형이 이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것과 같다. 열역학적 평형이 달성된 이후에도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총량이 겉보기로만 변하지 않을 뿐 분자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화학적 변화가 진행된다. 화학 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일한 속도로 끊임없이 양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이기 때문이다. 위의 수조 비유에서 수면의 높이는 맞춰졌지만, 그 이후에도 물 분자들은 정지하지 않고 수로를 통해 양 수조를 계속 왕래하는 것과 같다.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원자들이 쪼개지지 않는 단위로서의 실체라 하더라도 이들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다. 예를 들어 탄소(C) 원자는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흑연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흑연상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양상에 따라서 광물로서의 흑연이 될 수도 있지만, 신소재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나 그래핀(graphene), 또는 풀러렌(fullerene) 분자로 발현될 수 있다. 산소(O)나 수소(H), 질소(N)와 같은 다른 종류의 원자들과 결합되는 경우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부터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탄화수소들(CxHy)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단순한 당류인 포도당(C6H12O6)부터 생명의 근간을 이루는 단백질과 핵산의 뼈대를 이루기도 한다. 이 물질들은 동일하게 탄소를 중심 원소로 한 분자구조를 가지지만, 각각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화합물들의 성질들은 각각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선형적(linear) 조합이 아니라, 분자 전체의 전자구조로부터 ‘창발’된 비선형적 결과이기 때문에, 화합물들의 거시적 성질에서 탄소의 역할만을 환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예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anatta)’와 모든 성질은 관계에서 발현된다는 ‘연기(pratītyasamutpāda)’의 비유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유들은 불교만의 고유한 관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무아, 무상 그리고 연기는 초기부터 성립된 불교의 핵심 교리이긴 하지만 불교가 발생하면서 새로이 개발된 고유한 개념이 아니다. 기존 힌두교의 여러 학파에서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서 높은 합리성을 갖도록 정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초기 우파니샤드인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Bṛhadāraṇyaka Upaniṣad)》에는 “소금 덩어리를 물에 넣으면 그 물에서는 짠맛이 나지만 소금을 다시 건져내는 것은 불가능하듯, 개인의 자아도 브라흐만에 녹아들면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힌두교에서도 개인의 자아 형(form)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무상’의 관점을 견지해 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변하지 않는 자아 본성의 존재’에 대한 논의 등 두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철학적 주제를 제외하면, 실재 세계관에 대한 불교와 힌두교의 관점을 완전히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있는 작업도 아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밝혔듯, 화학적 현상들을 포함하여 자연과학적인 관찰 결과들을 불교의 이론을 통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쁘게는 고정된 관점에 천착하게 될 위험성 또한 지니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비유가 화학적 현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불교적 세계관의 핵심 개념을 미시세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시의 기능도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되는 비유 이상의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화학적 현상을 불교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명제의 단편적인 입증에 불과하며, 반증 가능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화학적 현상의 물리적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화학을 수행하는 ‘화학자의 일과 삶’에도 적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아트만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힌두교와 달리, 불교는 자아를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고정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오온의 집합(즉, 무아)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즉, 무상)와 연속적이고 여러 차원의 상호작용(즉, 연기)을 하는 외부 세계와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대승불교에서 ‘일체가 공하다’는 원리로 잘 정립되었다.

화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그를 수행하는 화학자이다. 불교의 관점에서 화학과 화학자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른 자연과학 분야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개별 화학적 현상을 넘어서 화학을 탐구하는 화학자, 화학공학자의 삶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건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윤리와 사상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전한 과학적 결과를 도출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다음 절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이 화학자의 일과 삶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화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숫따니빠따》의 게송에 나타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논하고자 한다.
화학자의 일과 삶, 그리고 불교
화학의 세계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으며, 여러 환경에서 그 원소들은 무수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고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규명되지 않거나 발견되지 않은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고, 새로운 화학적 발견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가설 또는 접근방법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학문연구의 배경에서 알려진 가설이나 자신의 생각에 천착하는 것은 과학적인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이런 집착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화학자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은 인간의 삶에 밀접한 중심 학문으로서, 산업적으로는 순수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비하여 인류의 복리를 증진하여 직접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가깝기 때문에 화학자들은, 특히 응용화학자나 공학자들은 명성이나 부에 접근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제로 엑손모빌(ExxonMobil)이나 다우케미칼(Dow Chemical), 화이자(Pfizer)와 같이 많은 화학 관련 거대 회사들이 기업 규모 및 매출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인류 전체 경제에 실시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과 같은 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산업과 함께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화학은 탄소중립과 같이 시급성 높은 시대적 요구에도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사업 분야에서도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화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독보적으로 경쟁이 격한 특성을 갖는다. 새로 게재되는 학술논문들 또한 양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국가와 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주도하며 이 경쟁을 끝없이 독려하고 부추긴다. 결과적으로 화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교수와 연구원, 학생을 막론하고 새로운 발견, 실험의 진행, 특허 및 논문의 획득, 다음 연구의 계획 등 연구개발의 모든 차원에서 성과 달성의 높은 압력에 노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 아래에서 연구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보고자 하는 집착, 더 좋은 저널에 게재하기 위한 욕망, 그리고 윤리의 경계선에 서게 하는 유혹까지 미혹에 빠지고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큰 위험에 항상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불교는 화학자들의 삶과 일을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화학 자체의 학문적 발전을 지속 가능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화학과 화학자는 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학자들의 삶과 일은 일체의 화학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대중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역사적, 철학적 맥락에서 쓰인 불경은 실로 그 양이 방대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경쟁적 환경에서 연구하는 이들에 대해 특별히 국한하여 서술된 텍스트를 발췌하기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보편성 높은 텍스트인 《숫따니빠따》로부터 화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화학을 발전시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숫따니빠따》는 상좌부불교의 빨리 정전(Pali Canon)에 속한 경으로, 쿳다카 니까야(Khuddaka-nikāya)의 일부를 이루며, 같은 니까야에 속한 《법구경(法句經, dhammapada)》과 함께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불교 텍스트 중 하나로 꼽힌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시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여러 간결한 경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집(經集)이라고도 불린다. 시와 금언 형식으로 서술되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으며, 12연기, 무아, 무상, 탐진치, 사성제 등 불교철학에서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개념들의 초기 모습 또한 엿볼 수 있다. 《숫따니빠따》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결되는 하나의 줄거리가 아닌 짧은 경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읽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중 가장 시대적으로 앞서며 초기불교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장은 제4장인 앗타까 왁가(Aṭṭhaka vagga, Snp 4)로, 각각의 구성 경전이 8줄의 게송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어로는 ‘the Chapter of Octets’라고도 번역되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의품(義品)’이라 일컬어진다. 특히 이 앗타까 왁가는 《숫따니빠따》에 등장하는 경전과 게송 중 시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언어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다.
앗타까 왁가는 16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교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주제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귀결되는지, 욕망과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움을 주는지, 실체와 자아의 성질은 무엇인지 등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8줄의 게송들을 통하여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앗타까 왁가의 가르침들은 불교를 공부하는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화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사상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아래 인용되는 《숫따니빠따》의 게송들은 호주의 아잔 수자토(Ajahn Sujato) 스님이 빨리어를 영문으로 번역한 영역본을 참고하여 국문으로 중역했음을 밝힌다.
화학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기존의 관점에 집착하여 전체 학문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화학자는 학문적 권위가 높을수록 동료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특정한 이론이나 생각에 매몰되어 개방성을 잃어버리면 학문 전체의 진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19세기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뵐러(Friedrich Wöhler)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인 요소(urea)를 합성한 결과가 실험 결과의 적합성과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받아들여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당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온 과학철학적 관점인 생기론(vitalism)이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생기론은 생체와 생물, 유기물은 생기(vital force)라는 특성이 있어서 무생물/무기물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이론이다. 현대 화학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어불성설에 가깝지만, 당대에는 가장 저명한 화학자들도 받아들이는 보편적 관점이었다. 당시 유럽 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농학자이자 유기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비히 또한 위대한 화학자였지만, 생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뵐러의 반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뵐러의 연구가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앗타까 왁가의 두 번째 경은 ‘동굴의 8게송(Guhaṭṭhaka sutta)’이라 불린다. 육신, 욕망, 그리고 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변화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집착, 무지, 그리고 고정된 관점에 천착하는 것을 ‘정신적 동굴’로 비유하여 경계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를 초월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굴의 경의 6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무언가에 집착하여 메마른 개울의 웅덩이에 갖힌 물고기처럼 허둥대는 자들을 보라. 이를 보고 미래의 삶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서 사심을 버려야 한다.
이 가르침은 끊임없는 혁신을 창출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화학자가 열린 마음을 갖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항상 깨어 있고 동료 연구자들과 협력해야 하며, ‘정신적 동굴’에 갇히지 말아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한다.
또한 화학자에게는 연구 윤리를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화학이 복잡한 실험과 정교한 측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 연구 결과물이 사람들의 삶과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화학 연구에서 연구 윤리 준수는 과학적 발견의 신뢰성 담보, 연구자와 대중의 안전 보장, 그리고 책임 있는 자원 활용으로 이어진다. 화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1999년 빅터 니노프(Victor Ninov)의 ‘118번 원소 조작 사태’는 경쟁적 환경하에서 연구 윤리 위반이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입자가속기의 적극적 활용으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원소를 형성하여 보고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니노프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여 ‘118번 원소’를 학계에 보고하였고, 처음에는 큰 찬사를 받았지만 재현성의 부재로 인한 여러 차례의 검증에서 데이터 조작이 드러났다. 이로 인하여 학계는 대중의 신뢰를 상실하여 연구 동력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동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니노프의 소속기관이었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까지 명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앗타까 왁가의 세 번째 경은 ‘분노의 8게송(Duṭṭhaṭṭhaka Sutta)’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욕망에 의해 부패나 거짓된 관점과 같은 잘못된 길에 빠질 것을 경계하고, 비판적 견지에서 참된 이해와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분노의 경의 7번째 구절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선호에 끌리고 특정한 믿음에 교조적 태도를 취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관점을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움직이며 자신의 믿음대로 말할 것이다.
욕망은 선호를 만들고, 그 선호는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져 본인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큰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가 놀랍고 가치 있을수록 화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언제나 자신의 연구 결과에 자아를 덧씌우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자세, 즉 개방성과 유연함 또한 화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이다. 경쟁적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성된 연구 성과일수록 그 결과에 자신의 고정된 아상을 투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를 극복하는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명성이라는 짐을 많이 진 학자일수록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를 행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학계 전체의 큰 진보로 이어질 수 있다. 올레핀 복분해(olefin metathesis)의 메커니즘 규명 과정에서 미국의 화학자인 로버트 그럽스(Robert Grubbs)가 보인 태도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산업적으로 중요한 화학반응인 올레핀 복분해는 1950년대 후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었으나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은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스 석유연구소의 이브 쇼뱅(Yves Chauvin)은 프랑스 국내 학술지에 그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옳게 규명된 결과였지만 프랑스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에게 읽히는 데 시간이 걸렸다. 미국에서 해당 반응의 연구를 선도하던 저명한 화학자였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그럽스 교수는 나중에 쇼뱅의 논문을 접하고 곧바로 자신이 제안한 메커니즘을 파기하고 쇼뱅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쇼뱅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럽스 교수와 MIT의 리처드 슈락(Richard Schrock) 교수는 고성능의 올레핀 복분해 촉매를 설계 및 합성할 수 있었고 쇼뱅, 그럽스, 슈락 모두 2005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다.
《숫따니빠따》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집착의 매듭을 풀고 흘려보내야 함을 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강조한다. 앗타까 왁가의 네 번째 경은 ‘청정의 8게송(Suddhaṭṭhaka Sutta)’이다. 스스로의 청정함과 정당함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집착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자신의 청정함에 집착하고 추구하거나 심지어 자부하면서 다른 이들을 청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미혹에 빠지는 첩경임을 경고한다. 다음은 청정의 경의 7번째 구절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꾸며내거나 받들지도 않고, 최상의 청정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의 단단한 매듭을 풀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세상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 결과에 아상을 씌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술한 그럽스 교수의 사례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학계 전체에 순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화학을 연구하는 자가 자신의 삶과 임무를 건전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류를 이롭게 하는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숫따니빠따》의 가장 오래된 제4장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소위 첨단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는 화학자에게도 《숫따니빠따》를 통해 전해지는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은 학문의 목적과 학자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특히 화학자는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적 압력과 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더욱이 많은 화학자들이 스스로 상당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평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 비하여 욕망이나 아상, 그로 인한 미혹에 더욱 빠지기 쉽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건전한 학문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과의 달성을 위하여 화학자들은 연구 현장에서 스스로를 더욱 잘 관찰하고, 자신과 학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릇된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나의 생각과 이론이라 여겨지는 것도 나의 오로지함이 아님을 아는 것이 권장된다.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나아가 세상을 해석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행으로서의 화학, 그리고 불교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조용히 앉아서 그 마음을 스스로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이요, 그곳이 바로 절이지. 그리고 그것이 불교라네.” 조계종 제8대 종정에 오르신 서암 스님이 후일 정토회를 일으킨 젊은 시절의 법륜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는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습을 바로 보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불교의 핵심 원리를 지극히 간결하게 설법한 것으로, 대중에 널리 회자되는 명언으로 전해져 온다. 승려와 사찰이 외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듯, 수행 또한 정해진 형(形)이 있는 것이 아니다. 큰스님의 말씀을 응용하자면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자 행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다.
불교의 수행은 탐진치를 끊어내고 일상에서 오는 괴로움과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여 참된 진리를 얻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다. 참선이나 고성염불(高聲念佛) 정근 등 불교에서 널리 행해지는 다양한 수행의 방식이 있지만, 수행의 목적만 옳다면 반드시 그런 모습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사찰에 들어가서 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실천할 수 있다. 이를 흔히 ‘생활 속의 수행’ 또는 ‘수행으로서의 생활’이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기존에 널리 활용되어 온 수행의 형태인 참선이나 정근에 비하여 효과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며 독서하는 것이 조용한 방의 책상에 앉아서 독서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방법과 방향만 바람직하다면 일상을 살아가며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이며, 긴 시간을 내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다.
화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화학자로서 삶과 일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정리하고, 원하는 특정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성패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갖고자 발원하는 것이 수행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연구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과 적합한 연구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즉 수행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잘 체계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오래된 가르침에 속하는 팔정도(八正道)이다. 이 여덟 가지 길을 따름으로써 탐진치를 끊고 괴로움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져 맑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수행으로서의 화학’을 화학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팔정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화학자가 삶과 일의 모든 맥락에서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 길은 정견(正見)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올바르다는 것은 어떠한 도덕에 근거한 당위가 아니라 여실지견(如實知見), 즉 편견이나 고정된 관점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을 말한다. 화학자 개개인이 자신의 가설에 집착하지 않고, 실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편견 없이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어떻게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앞 절에서 앗타까 왁가의 동굴 8게송과 청정 8게송을 논하며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두 번째 길은 정사유(正思惟)로, 올바른 생각과 의도를 갖는 것이다. 화학 연구는 인류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을 건전히 설정하고, 윤리적 기준을 견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경쟁심, 출세욕, 과시욕 등 다양한 욕망의 원인을 알고 그에 끌려가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팔정도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길인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은 연구자-수행자의 계율과 윤리적 기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정어는 바른말을 의미하며, 진실하고 유익한 말로 동료들과 소통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논문을 보고할 때도 정직하게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업은 바른 행동을 의미하며, 환경안전 및 연구 윤리의 엄격한 준수를 통하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연구 활동을 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명은 바른 생활방식을 말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탐닉을 지양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피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팔정도의 마지막 세 길은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으로 연구자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을 지속하여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정념은 마음을 깨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매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깊은 집중 상태를 유지해서 연구에 대한 몰입도와 완성도를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실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화학자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 실험 결과에 대한 욕망들, 그리고 결과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이는 생각 등을 집중하여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원인을 찾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그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괴로움을 사전에 관리하고 더 깊은 통찰을 얻는 발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행으로서의 화학’을 팔정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수행자와 연구자 양면에서 본질에 가까운 수행 방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일반적인 연구’와 ‘수행으로서의 연구’가 차이가 있다면, 수행으로서 연구는 모든 순간에 깨어서 보고, 가치판단이나 편견 없이 보고, 모든 관찰에 대한 마음의 일어남을 보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에게 필요한 것은 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홀로 수행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크다. 효과적인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주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비판적으로 토의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다. 모든 연구자가 수행을 연구 활동에 잘 녹아들게 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다면 연구 내 · 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며
화학은 자연과학 분야의 ‘중심 학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불교와 화학을 세계관과 원자론, 화학자의 삶과 일, 수행으로서의 화학,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화학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당대의 바이셰시카 학파의 세계관을 함께 소개하며 논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관점에서는 화학과 화학자가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불교가 화학자의 삶과 일을 개선함으로써 화학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 연구의 수행적 측면을 팔정도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현실적인 수행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필자는 독자들이 이 글을 통해 화학 연구와 불교 수행이 상호 호혜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연구 성과를 이루길 희망한다. ■
강종헌 jonghunkang@snu.ac.kr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동 대학원 졸업(석사).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화학공학 공학박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원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지도교수
불교와 천문학 / 강승환
- 기자명 강승환
- 입력 2024.09.06 21:06
- 수정 2024.11.11 22:21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특집 | 불교로 읽는 과학, 과학으로 읽는 불교

1. 사겁(四劫)
《화엄경》의 4겁
《화엄경》은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이야기한다.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나고 죽음을 반복하듯이 우주도 성주괴공으로 나고 죽음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우주가 처음 생겨나서는(成) 머물다가(住) 무너져서는(壞) 결국 비게 된다는(空) 것이다. 머문다는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곧 성주괴공은 우주의 생성과 유지와 소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성주괴공의 온전한 말은 성겁(成劫) 주겁(住劫) 괴겁(壞劫) 공겁(空劫)이다. 성주괴공에 겁을 합친 말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겁(劫)을 계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오랜 기간이라고만 한다.
어쨌든 이 성주괴공 넷을 합쳐 4겁이라 한다. 그러나 순서를 바르게 하자면 공을 앞세워 공성주괴(空成住壞)라 하는 것이 좋다. 처음 비었는데(空) 무엇인가 생겨나서는(成) 어느 정도 머물다가(住) 결국 무너진다는(壞)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너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다시 비워진다. 그리고 다시 생겨나, 머물다가, 무너져서는, 다시 비워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 일종의 우주 순환론이다.
대붕괴
위에서 본 것처럼 한번 생겨난 우주는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소멸한다. 종교적 견해는 대체로 우주의 소멸론이 우세하다. 종말론, 말세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주의 소멸에 대한 과학적 견해는 분명치 않다. 우주 생성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면서도 우주 소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우주 소멸이 별로 유쾌한 주제가 못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도 은연중 우주의 소멸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붕괴(大崩壞)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대파괴(大破壞), 대함몰(大陷沒)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빅 크런치(big crunch)이다. 우주가 언젠가는 모두 붕괴되어 소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 소멸에 대해서는 불교나 과학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륜(四輪)
4상
위에서 우주는 성주괴공을 무한히 반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기일까? 마지막 순환기라 추정하고 이 순환기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가모니가 우주를 마음으로 관조해 보니 지금의 우주 모습은 연꽃처럼 둥글었다. 또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의 상태였다. 이를 빈 모습 즉 공상(空相)이라 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었다. 이를 바람의 모습, 풍상(風相)이라 했다.
다음에는 바람이 더 발전하여 다소 구체적인 물질이 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무엇인지 확고하지는 않았다. 이를 물의 모습, 수상(水相)이라 했다.
이 물의 모습이 더욱 발전하여 결국은 굳고 단단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를 쇠 모습 즉 금상(金相)이라 했다. 현재 우리 우주의 모습이다.
현재 우리 우주의 전체적 모습은 연꽃이나, 처음에는 텅 빈 것과 같았고, 다음에는 바람과 같았으며, 그다음에는 물과 같았고, 마지막에는 쇠와 같았다. 처음 빈 것에서 무엇이 생겨나 점점 구체화하여서는 결국 굳어지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물론 이 4단계 사이에도 무수한 단계가 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위에 말한 빈 것, 바람, 물, 쇠의 4가지 모습이다. 이를 4상(四相)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 물, 쇠 등은 꼭 바람, 물, 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의 생존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이런 것들뿐이어서 이런 말을 들어서 비유로 삼은 것뿐이다.
바람은 무엇인가 있어서 느낄 수는 있지만 잡거나 만질 수는 없는 것이고, 물은 다소 구체화되었지만 확고하지 않은 것이며, 쇠는 확고히 굳어진 것 등 말이다. 만약 현대적 용어를 알았더라면 좀 더 정확히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쇠의 모습 금상(金相)에서 큰 연꽃이 피어나며 큰 바다가 생겨난다. 이 바다 위에 수미산이 솟아 있고 주변에 사대주(四大洲)가 있어 중생들이 사는 땅이 된다.
4륜과 인다라망
처음 석가모니께서 우주의 변천 과정 곧 4상을 설명하자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연꽃같이 둥근 우주를 늘어놓거나 한 줄로 세워서는 그 변천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범망경》에서 수레바퀴와 그물망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했다.
연꽃같이 둥근 우주를 양옆에서 손바닥으로 힘을 주어 힘껏 눌렀다. 그랬더니 수레바퀴처럼 납작하게 되었다. 이 납작한 모습을 쌓아 놓으니 그 변천 과정이 잘 나타났다.
맨 아래는 빈 바퀴인데 빈 모습을 뜻하고, 그 위는 바람 바퀴인데 바람 모습을 뜻하며, 그 위는 물 바퀴인데 물의 모습을 뜻하고, 맨 위는 쇠 바퀴인데 쇠의 모습을 뜻했다.
이를 공륜(空輪) 풍륜(風輪) 수륜(水輪) 금륜(金輪)이라 하며, 통틀어 4륜(四輪)이라 한다. 이때 바퀴는 말할 것도 없이 우주를 뜻한다. 물론 이들 사이에 무수한 단계가 있지만 그중 4가지를 대표로 든 것이다.
이번에는 이 바퀴를 더 납작하게 눌렀다. 그랬더니 그물망같이 얇게 되었다. 이 얇은 그물망을 겹겹이 쌓아 놓으니 수없이 많은 변천 과정이 잘 표현되었다. 이를 중중루망(重重累網) 곧 겹겹이 겹친 그물망이라 한다. 이때 그물망은 우주를 뜻하고 그물 매듭은 은하를 뜻한다.
중중루망에서 그물망 하나는 제망찰해(帝網刹海) 또는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 한다. 흔히 제석천에 드리워진 그물망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 제석천을 포함한 모든 하늘을 그물에 비유했다. 곧 우주를 비유했다. 제석천은 그 일부일 뿐이다.
평행우주와 중첩우주
현대 과학에 평행우주(平行宇宙, parallel universe)라는 말이 있다. 우주가 평행하며 평평하다는 말인데 이는 위에 말한 4륜이나 중중루망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가 공륜 풍륜 수륜 금륜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포개 놓았을 때 이를 옆에서 보면 평행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그물망을 겹겹이 쌓아 놓았을 때 이를 옆에서 보면 평행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곧 평행우주는 우주의 변천 과정을 통틀어 나타내는 개념이다.
또 현대 과학에 중첩우주(重疊宇宙) 중복우주(重複宇宙) 다중우주(多重宇宙) 다차원우주(多次元宇宙) 등의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겹쳐 있는 우주, 합쳐진 우주, 포개진 우주, 다져진 우주, 숨겨진 우주, 말려진 우주, 구겨진 우주, 뒤틀린 우주, 숨겨진 차원, 여분의 차원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모두 비슷한 뜻으로 겹쳐진 우주의 모습을 뜻한다. 이것도 위에 말한 4륜이나 중중루망의 뜻으로 평행우주와 같은 뜻이라 생각된다.
3. 연화와 연화장
연화
우주의 모습이나 변천 과정을 관조하거나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우주를 마음의 눈 심안(心眼)으로 봐야 한다. 곧 우주를 빛과 보석처럼 밝고 투명하게 꿰뚫어 봐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明), 광명(光明), 대광명(大光明) 등 갖가지 빛과 금강, 영락, 수정, 유리, 마노, 파리 등 갖가지 보석이 등장한다. 《화엄경》이 특히 그러하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떨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연꽃이다. 곧 현재 우주의 모습은 연꽃처럼 둥근 모습이다. 이를 연화세계(蓮華世界)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모습도 실제로 우주의 전체적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않다. 단지 어느 것으로 보든 그 모습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전체적 모습에 대한 견해가 없다. 육안으로 보는 당연한 결과이다.
연화장과 중중루망
연화세계는 다 형성된 우주 곧 현재 우주, 육안의 우주, 겉모습 우주라 할 수 있다. 4상의 마지막 단계인 금상(金相)의 모습, 4륜의 마지막 단계인 금륜(金輪)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 그 앞의 형성 과정이나 변천 과정은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우주의 형성 과정과 변천 과정 전부를 봤다. 갖가지 빛과 보석으로 관조해서 말이다. 만약 석가모니처럼 우주의 생성과 소멸 등 성주괴공 전 과정을 꿰뚫어 보면 그 모습은 어떨까?
연꽃이 중첩된 모습, 연꽃이 겹쳐진 모습이 될 것이다. 우주가 처음 옅은 것에서, 다음은 다소 짙은 것으로, 끝에는 아주 짙은 것으로 변천되었다면, 연꽃의 모습도 처음 옅은 연꽃에서, 다음은 다소 짙은 연꽃으로, 종국에는 아주 짙은 연꽃으로 변천될 것이다. 만약 보석처럼 본다면 옅은 보석에서, 다소 짙은 보석으로, 아주 짙은 보석으로 변천될 것이다.
이제 이 겹겹이 변천된 모습을 마지막 단계에서 거꾸로 바라보면 그 모습은 어떨까? 매우 장엄하고 찬란할 것이다. 옅은 보석의 연꽃에서, 다소 짙은 보석의 연꽃으로, 끝에는 아주 짙은 보석의 연꽃까지 겹겹이 겹쳐서 찬란히 빛나기 때문이다.
우주의 형성 과정이 차곡차곡 겹쳐 보인다고 해도 되고 공륜, 풍륜, 수륜, 금륜이 차곡차곡 겹쳐 보인다고 해도 된다.
이를 화장세계(華藏世界)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라 한다. 화려한 연꽃이 숨겨진 세계라는 뜻이다. ‘숨을 장(藏)’을 쓴 것은 앞의 과정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니, 앞서 말한 중첩우주, 중복우주, 다중우주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어디에 겹쳐지고 숨겨졌을까?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우주에 겹쳐지고 숨겨졌다. 육안의 우주, 겉모습 우주에 겹쳐지고 숨겨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실은 이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숨겨진 우주 곧 연화장(蓮華藏)은 보지 못하고, 육안의 우주 곧 연화(蓮華, 蓮花)만 본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는 연화와 연화장을 구분한다. 연화라 했을 때는 현재 우주, 육안의 우주, 겉모습 우주를 뜻하고, 연화장이라 했을 때는 그 변천 과정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앞서 그물망을 겹겹이 쌓으면 우주의 변천 과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중중루망(重重累網)이라 해서 그물망은 하늘을 뜻하고 그물 매듭은 은하를 뜻한다고 했다.
이것도 연화와 연화장처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얇은 그물망을 죽 걸어 놓는다. 그러면 처음은 옅은 보석의 그물망이 되고, 다음은 다소 짙은 보석의 그물망이 되며, 끝에는 아주 짙은 보석의 그물망이 된다. 이들이 순차적으로 늘어서서 찬란하게 빛난다.
이를 앞에서 바라보면 그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중중루망 곧 겹겹이 겹친 그물망이란 뜻으로 우주의 변천 과정을 통관한 견해이다.
이때 그물망 하나 특히 마지막 그물망 하나를 인다라망이라 한다. 곧 중중루망은 연화장의 개념이고, 인다라망은 연화의 개념이다.
‘염화미소(拈華微笑)’ ‘염화시중(拈華示衆)’이란 말이 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연꽃을 들어 보이자 모두 가만히 있었는데 가섭(迦葉)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이 염화미소 염화시중이 바로 연화장세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4. 연화장세계
세계해
이제 연화 곧 현재 우주, 육안의 우주, 겉모습의 우주만을 보기로 한다.
《화엄경》 〈여래현상품〉에는 세계해(世界海)라는 생소한 말이 나온다. 우리말로는 세계 바다인데,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세계해가 있다고 하면서 그중 11개를 예로 들고 있다. 예를 들면 가운데에는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가 있고 그 동서남북 사방에는 또 무슨 무슨 세계해가 있다는 식이다.
이는 우주 전체를 세계해라 했는데 이를 나눈 부분도 세계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없이 나뉜 세계해가 모여, 하나의 전체적인 세계해를 이루는데, 그 모습이 연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나눠진 세계해에는 각각 국토 부처가 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화장장엄세계해에는 연화장이라는 국토가 있고,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가 있다는 식이다. 이 화장장엄세계해가 연꽃이 숨겨진 장엄한 세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른바 연화장세계이다.
〈세계성취품〉은 세계해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수없이 많은 세계해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그중 둥근 모습(圓) 모난 모습(方) 등 11개를 예로 들고 있다.
세계해 모습 11가지: 둥근 모습(圓), 모난 모습(方),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은 모습(非圓方), 차별이 한량없는 모습(無量差別), 물이 도는 모습(水旋形), 산의 불꽃 모습(山焰形), 나무 모습(樹形), 꽃 모습(華形), 궁전 모습(宮殿形), 중생 모습(衆生形), 부처님 모습(佛形).
그러나 위에 말한 11개 세계해의 모습이 각각 어떤 모습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느 세계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가운데 있는 화장장엄세계해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연화장세계의 모습은 알 수 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연꽃(연화)이다.
〈화장세계품〉은 이 화장장엄세계해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세계해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도 화장장엄세계해만을 본다.
화장장엄세계해
〈화장세계품〉에 의하면 우리의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는 향수해(香水海) 향수하(香水河) 세계종(世界種) 세계(世界)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생소한 말인데 향수 바다, 향수 하천, 세계 씨, 세계로 풀이된다.
화장장엄세계해 전체를 향수해라 하는데 이를 나눈 부분도 향수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강이나 하천같이 생긴 모습을 특히 향수하 곧 향수 하천이라 한다. 또 향수해 안에 있는 은하를 세계종이라 하며, 세계종 안에 있는 별을 세계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향수해와 향수하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없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화장장엄세계해가 연꽃 모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세계종에 대한 설명은 있으며 그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종의 모습이 수없이 많다고 하면서 그중 수미산 모습, 강 모습 등 20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세계종을 은하로 보면 은하의 모습이 20개가 되는 셈이다.
세계종 모습 20가지: 수미산 모습, 강 모습, 회전하는 모습, 소용돌이치는 모습, 수레바퀴 모습, 전단 향나무 모습, 나무 수풀 모습, 높은 다락집 모습, 산당 모습, 넓게 모난 모습, 태아 모습, 연꽃 모습, 대나무 소쿠리 모습, 중생 모습, 구름 모습, 부처님 모습, 가득 찬 밝은 빛의 모습, 갖가지 구슬 그물 모습, 여러 문(門) 모습, 장엄구 모습.
또 각각의 세계종에는 각각 수많은 세계와 부처가 있다. 이른바 백천억화신(百千億化身)의 개념이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습도 이야기한다. 역시 수없이 많다고 하면서 그중 회전하는 모습, 강이나 하천 모습 등 18가지를 예로 들고 있다. 그 모습은 대체로 위에 말한 세계종과 비슷하다. 만약 세계를 별들로 본다면 그 모습이 18개가 되는 셈이다.
세계 모습 18가지: 회전하는 모습, 강이나 하천 모습, 소용돌이 모습, 수레바퀴 모습, 벽돌 모습, 나무숲 모습, 누각 모습, 시라당(보배 옥) 모습, 보만(보물의 주위에 치는 장막) 모습, 자궁 모습, 연꽃 모습, 구륵가(용의 이름) 모습, 갖가지 중생 모습, 불상 모습, 둥근 빛 모습, 구름 모습, 그물 모습, 문 모습.
은하
위에 말한 향수해, 향수하, 세계종, 세계 등의 개념을 현대 과학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재미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 우주에 3,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각의 은하에는 3,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한다. 물론 3,000억 개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 숫자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숫자가 아닌 현대 과학이 본 것과 불교가 본 것을 비교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 과학은 이 3,000억 개 은하의 전체적 분포 상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곧 연꽃이다. 이는 이 우주에 은하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몰려 있음을 뜻한다. 몰려 있는 곳은 몰려 있지만, 드문 곳은 드물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몰려 있는 모습은 어떨까? 강이나 하천처럼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마치 연꽃의 꽃잎과 같다. 이를 《화엄경》에서는 향수하(香水河) 곧 향수 하천이라 했다. 이 향수하들이 모이면 당연히 연꽃이 된다.
이제 연꽃잎 하나를 살펴보자. 사실 이는 수십억 수백억 개의 은하를 보는 것이다. 이 많은 은하가 모여 연꽃잎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연꽃잎 하나를 잘라서 본다. 아주 작게 말이다. 그러면 하나의 은하를 보는 것이다. 사실 이 하나의 은하도 3,000억 개의 별들이 모인 것이다. 이 엄청난 별들이 모여 연꽃잎의 작은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3,000억 개의 별이 모였다고 하지만 우주 전체로 봐서는 별것 아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숫제 작은 씨(種)라고 표현했다. 위에서 말한 세계종의 종(種)이 그것이다. 곧 씨는 3,000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이다.
이번에는 별 하나를 본다. 그러면 이 별 하나에도 많은 위성이 있다. 마치 우리 태양에 화성, 수성, 지구, 목성, 금성, 토성 등 많은 행성이 있는 것과 같다.
이때 별 하나 또는 태양 같은 것을 《화엄경》에서는 그냥 세계라 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연꽃을 이룬다. 어찌 보면 불교와 현대 과학의 견해가 비슷한 점이 있다.
은하 모습
위에서 세계종의 모습 20가지와 세계의 모습 18가지를 들었는데 그 모습은 서로 비슷하다고 했다. 현대 천문학도 은하의 모습을 설명한다. 막대 모습, 나선형 모습(바람개비), 수레바퀴 모습, 타원 모습, 안테나 모습, 소리굽쇠 모습 등등이다. 그러나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대여섯에 불과하다. 육안으로 보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모습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불교가 말한 강이나 하천 모습은 현대 과학이 말한 막대 모습과 비슷하고, 둥글지도 모나지도 않은 모습(非圓方)은 타원 모습과 비슷하며, 소용돌이치는 모습은 나선형 모습(바람개비)과 비슷하고, 수레바퀴 모습은 말 그대로 수레바퀴 모습이다.
은하 미리내(은하수)를 옆에서 보면 가운데가 볼록한 접시 모습이고, 위에서 보면 4개의 날개가 회전하는 바람개비 모습이다. 그런데 《화엄경》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4천하 티끌 수만큼의 향수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휘감아 돈다(有四天下微塵數 香水河 右旋圍遶).
여기서 말하는 4천하를 4개의 날개로 보고, 오른쪽으로 휘감아 돈다는 말을 바람개비로 볼 수도 있다. 이는 불교와 현대 과학이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현대 과학은 은하의 크기에 따라 은하,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등의 용어를 쓰지만, 불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세계, 세계종, 향수하, 향수해 같은 단어를 쓴다.
5. 공간의 두께
현재에 겹침
위에서 중첩됐다, 중복됐다, 겹쳐졌다, 포개졌다 등등의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겹쳐지고 포개졌을까?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우주, 육안의 우주, 겉모습 우주이다. 4겁 중 주겁(住劫)이라 할 수도 있고, 4륜 중 금륜(金輪)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겹쳐지고 포개졌을까? 현재 우주에 각 단계의 형상(形狀)이 그대로 겹쳐지고 포개졌을까, 아니면 각 단계의 성질(性質)이 겹쳐지고 포개졌을까?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하다.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형상이 그대로 겹쳐지고 포개졌다면 현재 우주에서 초기 우주를 그대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질이 겹쳐지고 포개졌다면 초기 우주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 둘을 모두 인정하는 것 같다. 형상이 그대로 들어 있다는 것은 석가모니처럼 수행에 따라 성주괴공을 그대로 꿰뚫어 보기 때문이고, 성질이 들어 있다는 것은 수행에 따라 점점 더 깊은 공(空)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둘이 같은 뜻일 수도 있다.
불교는 사실과학이고 사실이론이다.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며 허황된 것도 아니다.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뿐이다. 단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공간의 두께
공간의 두께(Space Dugge), 우주의 두께(Cosmos Dugge)라 했지만 적절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다. 물질의 두께(Matter Dugge), 만물의 두께라 할 수도 있다. 삼라만상 일체 만물에 두께가 있다.
영어로는 두께(thickness)가 좋지만 너비(width, breadth), 깊이(depth), 길이(length), 부피(volume) 등이 될 수도 있고, 한자로는 폭(幅)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께를 표현할 마땅한 용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화장세계가 연꽃들이 숨겨진 세계라면 연화장에는 연꽃들이 숨겨질 곳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이는 숨겨질 두께가 있다는 뜻이다.
4겁, 4륜 등 변천하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겹쳐 있다면, 마지막 단계에는 두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겹쳐질 곳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께가 없으면 겹쳐질 곳이 없다. 나아가 4겁, 4륜 등이 존재할 곳도 없고 변천할 곳도 없다. 이를 공간의 두께, 물질의 두께라 했다.
사실 불교뿐만 아니라 이기론(理氣論)이나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 모두 두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理), 기(氣), 질(質)로 변하는 것, 무극(無極), 태극(太極), 음양(陰陽), 오행(五行) 물질(物質)로 변하는 것 모두 적어도 마지막 단계인 물질에 두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겁이나 4륜처럼 변천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중첩됐다, 중복됐다, 겹쳐졌다, 포개졌다 등도 모두 그럴 곳이 있다는 이야기니 이는 그럴 수 있는 두께가 있다는 뜻이다. 두께가 없으면 그럴 곳이 없기 때문이다. 더 들어본다.
현실이 다른 외부 세계가 우리 세계에 투영되어 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정보는 현재의 순간에 모두 각인되어 있다.
하늘의 실체는 우주의 복잡한 구조를 덮고 있는 얇은 천에 불과하다.
막이 아주 방대한 영역에 퍼져 있다.
중력파는 시공간에 주름을 만든다.
시간과 공간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고무처럼 휠 수 있다.
위의 이야기는 중첩우주 나아가 우주의 두께를 뜻한다. 투영, 각인, 얇은 천, 막, 주름, 휘어짐 같은 말이 특히 그러하다.
투영되고 각인되는 것은 그럴 곳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이는 그럴 두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얇은 천은 막(膜, 브레인(brane), 멤브레인(membrane)) 이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막이 곧 두께이다. 주름 역시 평평한 면에 굴곡을 이루는 것이니 두께를 뜻하며, 휜다는 말 역시 공간의 두께를 뜻한다.
홀로그램, 곡률반경(曲律半徑), 스펀지 등의 말도 쓰는데 역시 두께를 뜻한다. 곧 위의 이론들은 모두 두께의 어느 특정 성질을 나타내는 말들이라 할 수 있다.
개념을 명확히 함
그럼에도, 모두들 두께란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리고는 구멍, 터널 등 신비한 말까지 등장시킨다. 이는 두께가 잘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이나 글로써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고, 있는 곳을 현실에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을 건 오직 듣는 이의 지혜뿐이다. 미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이해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가령 두께가 물질의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 있다, 너머 있다, 형이상학적으로 있다 해도 정확한 표현이 못 된다. 물질의 안에 들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정확한 표현이 못 된다.
또 두께는 실물에서 나타낼 수 없다. 부피를 가진 실물에서 이 두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다.
현대 물리학에 끈 이론(string theory, super-string theory)이 있다. 필자는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약 끈의 두께를 세로로 아주 얇게 자른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공간의 두께를 뜻하는 것이 된다.
물질을 입자로 파악하면 두께가 표현되지 않지만, 끈으로 파악하면 두께가 잘 표현된다. 끈 자체가 두께이기 때문이다. 입자는 연화(蓮華)를 뜻하고 끈은 연화장(蓮華藏)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공간의 두께, 만물의 두께라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 불교와 현대 과학은 물론 모든 종교와 문화가 만나는 중요한 길목(접점)이기 때문이다.
6. 공색(空色)
문화
공간의 두께는 정신세계, 성질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승과 저승에서 저승이 형성되는 곳이고,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 있는 곳이며, 우리 마음이 머물러 미련과 원한이 머무는 곳이고, 선업과 악업이 축적되는 곳이다. 또 사물의 성질이 거처하는 곳이고, 만유인력에서 인력이 머무는 곳이다,
이와 같이 두께에는 여러 성질이 한데 어우러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다, 없다(有無)’ ‘살았다, 죽었다(生死)’ ‘움직인다, 고요하다(動靜)’ ‘오고, 간다(去來)’ ‘물들었다, 깨끗하다(染淨)’ 등 서로 상반되는 두 상황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고,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양극 음극’ ‘양자 전자’ ‘물질 반물질’ 등 서로 상반되는 두 상황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성질의 두께를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 위에서 말했듯이 각종의 문화, 종교, 철학, 과학이 된다. 이 중 조금 더 체계적이고 뛰어나게 설명한 것이 각종의 뛰어난 문화와 종교, 철학, 과학이 되는 것이다.
곧 불교는 석가모니가 이 두께를 공색, 3계 10계 등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고, 이기론은 성리학자들이 이 두께를 이기질, 음양 5행 등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며, 유일신은 신학자들이 이 두께를 신과 인간 등으로 나눠서 설명한 것이다.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 모두 두께의 무한한 성질 중 어느 일부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설명은 못 된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지금의 종교나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속 시원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인류를 구제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 외에도 새로운 설명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인류를 구제할 참신한 설명법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공의 뜻
불교의 공색(空色)은 공간의 두께를 크게 이등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과 물질, 본질과 현상의 뜻도 된다. 참과 거짓, 진실과 허망이라 해도 된다.
물론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눈 것이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불교 이론이 그렇든 공색도 방편이다. 이제 공과 색을 나눠서 본다.
색은 항상 한계에 도달한다.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이다. 움직이고 변하는 것에는 불변의 진리가 없다. 이른바 제행무상(諸行無常)으로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항상함이 없다. 결국 허망하다. 따라서 불교는 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공은 이해하기 쉬운가? 만만찮다. 우선 공은 어떤 형상이나 모습이 있는가? 아니다. 어떤 현상(現狀)이나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곧 한결같고 균일하며 평등하고 변함없는 그런 상태이다. 어떤 기복(起伏)도 없다. 이런 공은 물질로 다뤄질 수 없다. 공은 색깔이 있는가? 있다면 무슨 색깔인가? 잘 모른다. 공의 모습을 모르니 색깔도 알기 어렵다. 어떤 이는 희다(白) 밝다(光) 검다(黑)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필자의 수준을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한다.
또 불교의 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공(眞空) 곧 우주의 진공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는 다른 것이다.
우주의 진공은 진공이라는 물질이다. 원래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할 물질이 몰려서 별이 된 후 남은 것이 진공이다. 따라서 진공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진공이라는 그 어떤 물질이다.
위에서 우주는 성주괴공을 무한히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공들은 서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잘 알 수가 없다. 단지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곧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여래는 모두 같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성주괴공의 공과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들어가는 공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도 확언할 수가 없다. 모두 실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주괴공의 공도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고, 수행해서 들어가는 공도 적어도 필자는 실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먼저 성주괴공의 공을 무엇인가 있는 공 또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진짜 진공(true vacuum)으로 보고, 수행도 초기 단계로 본다. 그렇다면 이는 같을 수도 있다. 이때는 불교의 공과 현대 과학의 공이 같다. 이는 곧 불교와 과학이 서로 통하며 불교의 공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니 연구실에서 어느 정도의 깨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초보 단계일 것이다.
그러나 성주괴공의 공을 아무것도 없는 공 또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가짜 진공(false vacuum)으로 보고, 수행도 깊은 단계로 보자. 그러면 이는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실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수행으로만 도달할 수 있다. 맑은 마음으로만 가능하지 생각과 사고로는 이르지 못한다.
불교는 이 2가지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 것 같다. 곧 불교의 공은 무언인가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기도 하다.
공의 유형
무엇인가 있는 공은 무엇인가 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우리는 이 공을 중시한다. 이 공을 거쳐야 없는 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에서 이렇게 말한다.
빈 것(공)에는 ……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맑은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不空者……常恒不變 淨法滿足).
곧 공은 비지 않았고 어떤 맑은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 맑은 진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물론 물질적 개념이 아닌 정신적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도 이런 견해가 있다.
텅 빈 공간이라 해도 거기에는 영혼이 존재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함께 영적인 물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들은 공(空)이 말 그대로 텅 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는 말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일체의 움직임과 사유를 뛰어넘는다. 움직임과 사유가 없으니 시간과 공간도 없다. 이런 개념도 없다. 이런 것이 없으니 그 이후 아무것도 없다. 적멸(寂滅), 적정(寂靜), 고요 그런 상태다.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진다. 부처의 삼매나 열반이 그런 상태일 것이다.
인법유무제등(人法有無齊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과 현실, 진실과 허망 사이에서. 일찍이 원효대사는 《이장의(二障義)》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과 우주의 있고 없음이 가지런히 같다(人法有無齊等).
인법유무제등. 이 말은 원효대사 《이장의》의 총결 구절이다. 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는 것이고, 없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주 삼라만상이 없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은 허깨비라도 있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은 그것도 빈 것이란 뜻이다.
성주괴공 중 성주괴(成住壞)가 ‘있다’에 속하고, 공(空)이 ‘없다’에 속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이 ‘있다’에 속하고, 죽은 뒤가 ‘없다’에 속할 수도 있으며, 깨치지 못해서 육도를 헤매는 것이 ‘있다’에 속하고, 깨쳐서 공에 이른 것이 ‘없다’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결국 환상이고 헛것이다.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말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바탕 꿈이고 연극이다. 결국은 죽고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에 이 둘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있고 없음이 가지런히 같다’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같다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거리낌 없는 행동이 나온다. 도무지 거리낄 것이 없다. 집착할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다. 일체가 무대이고 나는 배우인데 무엇을 거리끼는가? 배우가 무대에서 어찌 노래하고 춤추지 않겠는가? 이에 노래하고 춤춘다, 곧 무애가(无㝵歌), 무애무(无㝵舞)다. 거리낌 없는 노래, 거리낌 없는 춤이다. 통틀어 무애행(无㝵行)이라 한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위대한 철학가 신라 원효대사가 한바탕 살다 간 모습이다. 생사를 뛰어넘는 자유를 대자유(大自由), 무애(无㝵)라 한다. ■
강승환 kp8046@naver.com
경북 상주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리학과 졸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40세가 넘어 원효대사를 비롯, 우리 문화 연구에 매진하였고 틈틈이 관련 저서를 펴냈다. 소설 《땅따먹기》 《이야기 원효사상》 《우리도 잊어버린 우리문화 이야기》 《불교에서 본 우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 권으로 만나는 원효전서》 《원효의 눈으로 바라본 반야심경》 등의 저서가 있다
'관심통 > 인문·예술·종교·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승은 끝났다 /시현 스님 (0) | 2024.09.10 |
|---|---|
| 화이트헤드와 다르마키르티 - 합리적인 종교, 성스러운 철학 / 권서용 (0) | 2024.08.21 |
|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0) | 2024.07.06 |
| 돈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역사적 전개 / 박경준 (0) | 2024.05.27 |
| 한국의 대표 불교종단 / 상제가 부처와 보살을 혼내다니!!! (0) | 2024.05.24 |